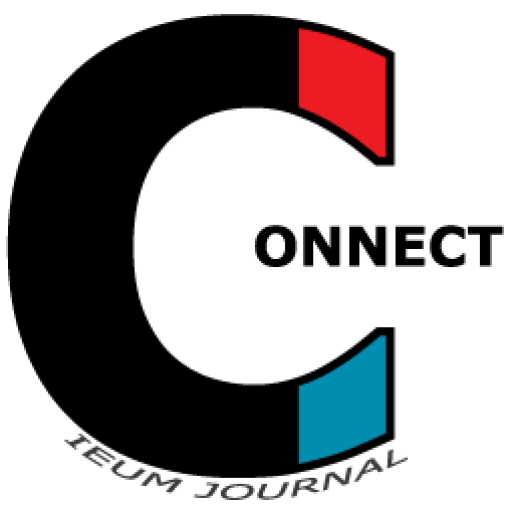신의 존재를 믿느냐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믿느냐’는 말에 궁금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보편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사바하>는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이 되었지만 죽음을 맞이하고, 신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신의 존재에 대해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바하(娑婆訶)’는 불교용어로, ‘원만한 성취’, 즉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말로써 어쩌면 모순되게도, 결말이 물음으로 끝남에 비해 제목은 기원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독이 원하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떠한 기원에서 물음으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한 사람과 그 사람의 최후를 바라보는 사람의 물음의 시선이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작품 속에서 김제석(유지태 분)과 박웅재(이정재 분)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김제석은 자신이 고통에 찬 속세를 구원하기 위해 온 미륵불이 됨으로써 해탈의 성취로 불로불사의 상태를 맞이하지만, 박웅재는 목사로 해외선교를 나갔다가 온 가족이 신의 이름으로 살해를 당하는 모순적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인물은 흥미롭게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종교적 인간’에 대한 시선들을 대변합니다. 불로불사의 상태를 성취한 김제석이 자신을 파멸시키러 온 ‘그것’을 죽이기 위해 어린 여자아이들을 살해함으로써, 결국 그도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으로 변합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파헤치는 박웅재는 김제석의 파멸을 통해, 성직자이지만 담배를 무는 위선적인 모습에서 진정으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두 등장인물의 엇갈린 태도를 통해서 감독이 묻고 싶은 것은 ‘신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인간이 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작품에서 영화적인 상상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역시나 상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줄거리에서 등장하는 다채로운 종교적 도상들과 상징들은 중심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파생해냅니다. 일상적인 물건에서 특정 종교에서 사용하는 상징들까지, 상징들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물론 영화에서 특정 장면이나 물건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들을 생각해보면 새삼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바하>가 원체 마니악적인 탓도 있지만, 이러한 상징들을 알면 더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재미가 있을 듯합니다.
작품을 관통하는 상징은 등불과 눈(snow)입니다. 김제석은 불교에서 메시아 역할을 담당하는 보살인 미륵보살(어차피 성취하므로 부처로 취급해 미륵불이라고도고 합니다)이 되면서 ‘늙지 않음’을 성취하는 등불로 비유됩니다. 그 등불은 주변을 밝히는 속성으로 인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별(북극성)으로 모습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러한 빛의 속성은 주변의 어둠을 없애는 것으로 현명함과 지혜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등불-북극성-선함-지혜는 한 세트를 이루며, 나중에 김제석이 이러한 상징들을 자신의 손으로 하나씩 없애가면서, 이후에 불타죽는 모습은 영화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웅재와 관련된 상징들 또한 재밌습니다. 박웅재는 추운 겨울 명품 코트를 입고 나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과거 신의 뜻을 찾았다 가족의 살해를 경험하고 돈을 쫓는 모습과 종교단체들을 파헤쳐 기부금을 얻으려는 태도를 통해 차갑고, ‘이성’적이며, 김제석의 최후를 목격하고 돌아가는 장면에서 눈이 등장하는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영화에서 눈은 이성과 의심, 그리고 계속 되는 고민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차갑고, 쌓여 있지만, 불을 만나면 남김없이 녹아버리는 그 속성은 캐릭터에 부여된 과거와 그의 태도를 대변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심지어 그가 등장하면 눈이 옵니다!)
더불어 지혜(등불)과 지식(눈)의 대비를 조절하는 ‘그것’의 상징도 흥미롭습니다. 짐승의 속성인 털과 그것이 벗겨지면서 얻어지는 수인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 일정한 지혜를 얻을 때의 과정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다문을 대면할 때 취하는 수인(손짓)들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방해물을 없애고 그것을 땅의 신이 증명했다는 항마촉지인, 자신 내부에 있는 두려움을 밖으로 내버리라는 시무외인, 그리고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쓰는 아미타구품인 등은 그가 지혜를 얻었으며, 너의 두려움을 없애고 진리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징들의 다양한 활용은 영화의 기본 줄거리와 덧붙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을 곱씹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특히나 오컬트 및 여러 종교에서 소문으로 도는 신비스러운 행위들을 표현할 때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작품에서 왜 상징들을 넣었을까요? 단순히 장르적 특징이라고 우기기에는 작품에 대한 예는 아닐 듯합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여기에 나타난 종교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오해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와 이해는 한 끗 차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이야기 내부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는 혐오스러운 것들도 있고(가령 뱀이나 염소 같은), 좋아 보이는 것(늙지 않는 젊음, 사슴, 연꽃)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 될 수도, 더불어 아름답게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을 담보합니다.
더불어 생각해볼 점은 이야기의 특징상 악인과 선인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작품 내에서는 악인과 선인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악한 행동을 선택한 사람과 세속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렇지 않은 현상들을 탐구하는 사람들, 믿는 바를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과 흉한 것을 가리기 위해 열심히 성스러운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 같이 다양한 사람들의 원인이 등장합니다. 비단 이러한 행위들이 단편적으로는 어떤 것은 기이하고 어떤 것은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그에 비해 내면의 이야기들은 반대로 보이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과 역설의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가는 모습들은 지금 이 사회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세계를 이해하는 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해 작품을 제작한 장재현 감독의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상 깊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했다는 말과 함께,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면에서 그의 태도를 조금은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언급을 통해 이 영화에서 다루고 싶은 바는 ‘인간은 어떻게 다른가?’ 또는 ‘그가 생각한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물음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론해봅니다. 모든 것을 성취했지만 성취한 것을 잃어가는 사람들, 일정한 목적을 성취하려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태도. 그러한 태도 속에서 여러 상징들이 태어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는 종교학에서는 ‘신이 있다고 가르치기보다는 신이 있다고 믿는 인간들이 있을 뿐’이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다양한 인간이 믿음이라는 태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짧은 감상으로 끝맺으려고 합니다. 영화의 상징들이 이야기 안에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매번 다른 태도들을 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모두 뜻한 바 이루시는 이번 달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저도 그럴 것이니까요. “사바하.”
Written by 이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