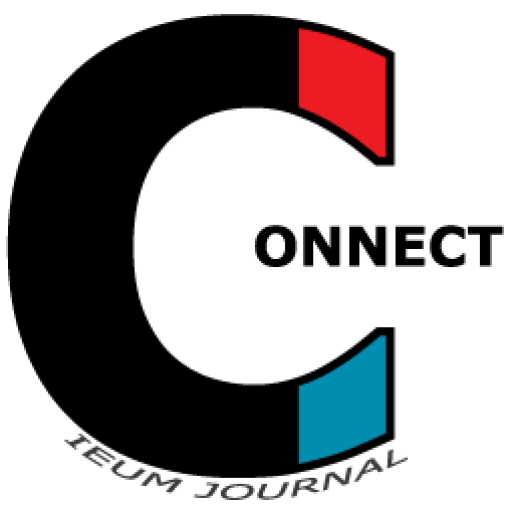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문맹』, 우리는 언어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다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나의 직업은 편집자다. 가끔 비슷한 직종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 그 때마다 ‘문과계가 배출할 수 있는 직종 중에서 가장 기술직’이라는 우스갯소리는 꼭 나온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하다. 편집이라는 일은 생각보다 기술을 요한다. 요새야 기획에도 발을 걸치고 있긴 하지만, 편집자의 미덕은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름 기술직에도 한계는 있다. 글을 매개로 삼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언어’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다. 내가 가진 기술은 오로지 이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만 쓸모가 있다.
한국어를 사용할 때조차도 나는 내 능력을 백퍼센트 전부 발휘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해외로 나가 그 나라의 책을 편집해야 한다면? 그 나라 언어를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지금 한국에서 하는 만큼 잘할 수는 없다. 편집자는 저자보다 더 그 원고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작가가 잡아내지 못한 부분을 악착같이 찾아내어 장제목과 부제목을 붙이고, 책의 제목과 부제를 만들고, 책을 홍보할 때 사용할 카피 문구들을 써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언어를 배운다고 해서 금방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최근 내 주위에는 ‘탈조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워킹 홀리데이를 가는 이들도 있고, 미리 언어 공부를 하며 준비하는 이들도 있으며 이미 넘어가서 자리를 잡은 이들도 있다. 나도 그들처럼 ‘탈조선’을 꿈꾸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탈조선’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언어에 기대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이니까. 그야말로 문과계 기술직이 아닐 수 없다.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문맹』을 읽을 때만큼 내가 언어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들은 없었다. 아고타는 정치적 정체성 때문에 헝가리를 건너 스위스로 망명한다. 몇 편의 시를 헝가리 문예지에 발표하기까지 했던 아고타는 스위스에 와서는 시계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문맹’이 된다. 그때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 아고타는 이렇게 적고 있다.
사막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사회적 사막, 문화적 사막. 혁명과 탈주의 날들 속에서 느꼈던 열광이 사라지고 침묵과 공백, 우리가 중요한, 어쩌면 역사적인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했던 나날들에 대한 노스탤지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뒤따른다.
우리는 이곳에 오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했다.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몰랐지만 틀림없이 이런 것, 활기 없는 작업의 나날들, 조용한 저녁들, 변화도 없고 놀랄 일도 없고 희망도 없는 부동의 삶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잘살고 있다. 우리는 방 하나 대신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석탄이 충분하고 음식도 넉넉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비하면 너무 비싼 값을 지불한 셈이다.
아침의 버스 안에서 검표원은, 매일 아침 보는 뚱뚱하고 유쾌한 검표원인데,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내 옆에 앉아 나에게 말을 한다.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스위스가 소련인들이 여기까지 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나를 안심시키려고 한다는 것 정도는 이해한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더 이상 슬퍼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말한다. 나는 웃는다. 나는 그에게 소련인들이 무섭지 않고 만약 내가 슬프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금 너무 많이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직장과 공장, 장보기, 세제, 식사 말고는 달리 생각할 것도, 할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잠을 자고 내 나라 꿈을 조금 더 오래 꿀 수 있는 일요일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에게 말하지 못한다.
어떻게 그에게,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짧은 프랑스어로, 그의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난민들에게는 사막, 사람들이 ‘통합’이라든지 ‘동화’라고 부르는 것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건너야만 하는 사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나는 어떤 이들은 끝끝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1)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다. 이것이 바로 내 ‘탈조선’의 미래이자 다른 이들의 현재였다. 얼마 전 다녀온 일본에서 나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름 일본어를 할 줄 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일본인들은 내 한자어 발음을 알아듣지 못했다. 한국에서의 나는 친화력이 좋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일본에서의 나는 약간 소심하고 눈치를 보는 외국인이 되었다. 그때 느꼈다. 내가 입 밖으로 내뱉는 단어와 문장은 곧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을. 그리고 내 머릿속의 생각을 구성하는 언어는 곧 나의 정체성이 되어 나를 구성한다는 것을. 편집자든 아니든, 결국 우리 모두는 그 나라의 언어에 기대서 살아간다는 것을.
짧고 단순하지만 깊은 무게가 실린 『문맹』의 문체는 전부 현재진행형이다. 자신의 이야기인 동시에 누군가 현재 겪고 있으며 언젠가 겪을 일이기 때문이리라. 책을 덮으며 제주도에 있다는 시리아 난민들을 떠올렸고,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떠올렸다. 얼마 전 동네 감자탕집에서 동남아 사람들이 소주를 마시며 자기네들 말로 떠들고 있었다. 그들도 이곳을 ‘건너야만 하는 사막’이라고 생각하겠지.
Written by 박복숭아
1) 아고타 크리스토프 저, 백수린 옮김, 『문맹』, 한겨레출판, 2018, p.89~p.90.
*이 연재물은 파주의 동네서점 땅콩문고와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입니다. 땅콩문고에서 운영하는 책 정기구독 프로그램 <월간 땅콩문고>로 받은 책을 읽고 리뷰를 씁니다.
<월간 땅콩문고>는
https://docs.google.com/forms/d/1-RaNIgTmc1XKYR2lfj2NOOhp4qcO0S6XRJKNEcEvyqE/viewform?edit_requested=true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