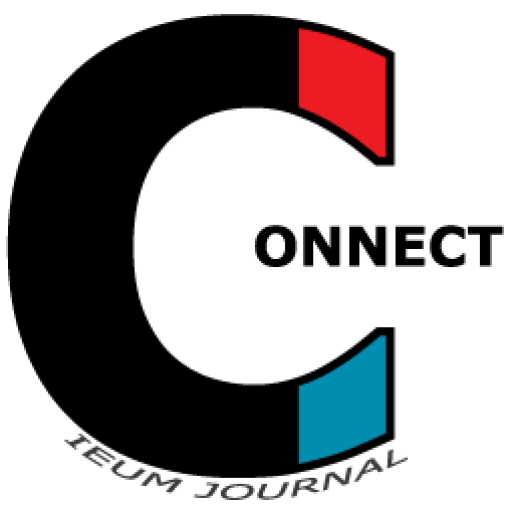설날이라고 고향에 내려와 있습니다. 달아오른 전기장판의 강력한 전자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이제 집밥에 대해서 뭔가 두서없는 글을 써봐야겠습니다.
집밥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는 요즘입니다.“집밥 ○○○”이라는 방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실은 요즘에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집밥 같은 백반집’이라든가,‘집밥 같은 도시락’같은 말을 들어왔으니까요. ‘집밥 같은’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익숙함, 편안함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것이 진짜‘집밥’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집밥을 말할 때 익숙함과 편안함을 떠올린다면 그것은 어떤 밥상일까요. 아침에 등짝 두드려 맞고 일어나면 차려져있는 밥상.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와 멸치볶음, 계란 후라이 하나 정도. 뭐 그런 것 아닐까요. 혹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밥솥에 들어있는 밥과 가스렌지 위에 준비된 데우기만 하면 되는 찌개, 냉장고 안에 있는 밑반찬 등 그런 일상적인 식탁이 아닐까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집밥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원룸의 싱크대를 보면 즉석밥과 라면, 각종 건면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쌀도 있지만 오래 묵었습니다. 냉장고엔 이런저런 소스와 인터넷으로 구입한 김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밑반찬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에, 제가 사는 집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채소는 항상 있는 편입니다. 요리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귀찮아서 잘 안하는 쪽입니다. 일인 가구 사람들 사는 게 대충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전자의 집밥을 그리워합니다. 일종의 응석 같은 게 녹아있는 것이지요. 여기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매일 밥 차려내느라 지긋지긋한 전업주부도 친정엄마의 밥상은 그리운 법이니까요.
그렇습니다.“엄마”입니다. (두둔!)
그런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가르치는 어느 교수님 수업에서 학생의 시나리오에‘엄마의 부재를 엄마가 차려주지 않은 밥상 앞에서 느끼는 장면’이 등장하면 그렇게 혼을 내셨다고. 이십여 년 전부터요. “엄마 하면 밥만 반사적으로 떠올리는 것들이 무슨 영화를 찍어”하고. (뜨끔합니다. 네. 저는 영화는 찍지 않지만요)
한편으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집밥과 그에 대한 노동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독립하여 집에서 밥을 해먹는다는 일이 생각보다 만만찮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혹은 카드고지서를 들여다보다 생활비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때. 바로 더 이상 엄마가 차려주지 않는 밥상 앞에 앉을 때 말이지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싸움구경하다가 그런 논쟁을 보았습니다. 무슨 방송에 나온 한 일인 가구 여성의 생활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한달 생활비 중에 식비가 얼마인데 그게 많다, 적당하다 하는 논란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한 끼에 얼마 꼴(요즘 시내 식당가 평균가격 수준)인데 그게 뭐가 많냐는 입장. 그렇게 지출해서 돈은 언제 모으겠냐, 집에서 밥해 먹고 도시락 싸고 다니면 된다 하는 입장, 등등.
뭐 쿨타임 차면 다시 판이 벌어지는 흔한 논쟁거리였습니다만, 그런 게 눈에 띄었습니다. 아, 어떤 양반들은 집에서 밥을 해먹고 도시락을 싸고 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동의 비용은 전혀 생각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은 나아가서, 저 양반들은 직접 부엌살림을 해본 적이 있을까? 있다면 저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할 텐데 하는 데 이릅니다.
일인 가구에서 과연 집밥을 해먹는 것이 그렇게 싸게 먹힐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밥을 해먹고 치우는 일이라는 게 참으로 사소하고 반복적이며 끝이 나지 않는 노동입니다. 일인 가구라면 일을 분담할 수도 없지요. 식재료비용을 보면 삼인 가구에 비해서 일인 가구의 식비가 삼 분의 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면만 따진다면, 어지간히 부엌살림에 숙련되지 않은 일인 가구라 할 때 그냥 매식이 왕왕 싸게 먹힙니다(물론 매끼니 햇반에 참치캔만 먹으면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아낀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 되겠지요.
이를테면, 도시에서 집의 기능의 변화를 생각해봅시다. 지대地代가 오르면 공간은 협소해집니다. 그것이 원룸과 고시원에 이르면 휴식과 수면이라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남기고 나머지 전통적인 기능을 아웃소싱하게 됩니다. 가령 마당은 공원으로 대체하고, 서재와 사랑방은 카페가 대체합니다. 대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니 집에서 먹던 밥을 식당 밥으로 대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가사 노동을 전적으로 주부가 짊어져야 했던 세대에 살았습니다. 어릴 때 농사를 짓던 집이었으므로, 가사 노동 뿐만 아니라, 농사일, 여러 남매의 육아까지 말 그대로 뼈 빠지는 노동을 주부가 짊어져야 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 쉬워서 주는 밥만 넙죽넙죽 잘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자취에서 완전 독립까지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는 생활이 이럭저럭 햇수로 이십 년 가까이 되다보니 이제 그 노동에 대해 대충 어림짐작은 가능합니다. 내가 나 하나를 먹여 살리는 일도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도시의 일인 가구로 살고 있습니다. 가장 한 명이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전통적인 4인 가구 모델이 이미 무너졌고, 새로운 가족 모델의 표준이 형성되기 어려운, 아니 표준 자체가 사라지고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각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때입니다.
도시의 일인 가구로 살면서, 자연스레 매식과 인스턴트 식사를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위에 주절주절 쓴 것처럼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사실 끼니 차려 먹는 일의 귀찮음이 만만찮기도 해서요. 그것도 다 노동이니까요.
그러다 며칠에 한 번씩 그런 때가 옵니다. 아, 밥을 해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요.
그것은 일종의 허기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매식과 인스턴트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정서적인 측면인지, 몸이 알아서 원하는 영양학적인 측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서두요.
그런 때가 오면 밥을 짓습니다. 냉장고에 밑반찬을 확인하고 없으면 시장이나 마트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차피 장을 보기는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국을 끓입니다. 그런 때 끓이는 국은 이상하리만치 당연하게도, 어릴 때 지겹게 먹던 그런 국 종류입니다. 제주도에서 농사짓던 집의 어머니가 그냥 대충 된장 풀고 그때 흔한 푸성귀 썰어 넣고 끓이시던. 국을 끓일 때마다 점점 어릴 때 먹었던 맛에 가까워져가는 것에 신기해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집밥 게이지가 채워집니다.
집밥이 무엇일까요. 그냥 집에서 해먹는 밥입니다. 밥이라는 것이 당연히 집에서 먹는, 먹어야 하는 시대엔“집밥”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밥”이었지요. 그러다 대칭점에“외식”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밥을 먹는 공간이 더 이상 집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 비율이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자 새로 명명된 단어가“집밥”이라는 말입니다. 단어 자체가 우리 식생활의 비중이 매식으로 크게 한 발자국 옮겨갔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대신“집밥”을 찾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가치들을 투영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음식이 아닌, 애정을 기반으로 한 가족공동체의 안온함 같은 것 말이지요. 그것은 흔히“엄마”로 대변되어 왔습니다.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전담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보다 더 위에서 작동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부장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부터 착실히 무너지고 있고, 성장기에 체득한 구세대의 가치와 밥을 먹고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어쩌면 방송에 나오는 집밥 프로그램을 보며 위안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Written by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