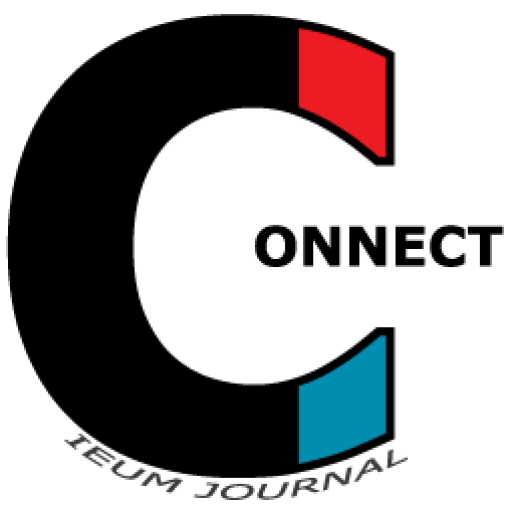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그거 되게 철학적인 문제 아냐.”
예전에 친했던 동생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내가 들은 답이었다.
“누구에게나 남성성과 여성성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내가 완전 남자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형은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킨 거고.”라는 이야기였다.
커밍아웃 때마다, 그리고 내가 ‘논바이너리’임을 인정받지 못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차라리 바이너리 트랜스젠더(나의 경우에는 MTF)였다면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 일이 없었을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웃긴 점은 사실 내가 걸어다니는 커밍아웃 수준이기 때문에 비성소수자들도 나를 딱 보면 ‘여자 같은 남자’ 정도로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젠더퀴어’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졌다면 내가 커밍아웃하기에 훨씬 편했겠지. 어제 타로학원에서는 ‘너같이 꽃이 범벅된 옷을 입고 미에로 화이바 먹는 남자는 처음 봤다’며 원장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더라. 정말 그렇게 부르고 싶었지만 그렇게 부르면 다른 선생님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눈에 선해서 그냥 삼켜냈다.
사실 2016년 ‘퀘스쳐너리’에서 출발해서 ‘안드로진’, 그리고 지금의 ‘논바이너리 젠더퀴어’에 오기까지 수많은 부정과 혐오를 당하고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그거 나를 부정하는 말이야’ ‘그거 논바이너리 혐오야’라는 말을 한 것은 손에 꼽는다.
가장 최근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남성 취급을 당한 일이 두 번 있었다. ‘왜 나를 남자 취급 하냐’고 얘기했지만 그때 나는 웃고 있었다. 왜냐면 그 당시 대화 자리가 화기애애했으니까. 내가 정색하고 나가버리면 분위기만 싸해지는 거고. 그렇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지 않아도 얘기하면 알아들을 사람들이기에. 하지만 그 당시 내 기분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에 충분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약간 복잡한 혐오기제가 발동됐다. 나의 애인도 젠더퀴어인데 애인과 함께 사는 일상생활을 얘기하다가 ‘야 네가 집안일을 많이 해야지 왜 그걸 애인이 더 많이 하게 하냐’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얘기를 한 사람도 페미니스트였다. 내가 듣는 입장에서는 은연중에 나를 남성의 자리에 위치시키고 ‘남자인 네가 애인한테 잘해야지’라는 발화였는데, 그건 어찌 보면 나뿐만 아니라 애인까지 ‘디스포리아’에 휩쓸리게 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우리 둘 다 젠더퀴어임을 발화자가 모르지 않았다.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도 그랬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고 그 사람도 ‘그래 너 젠더퀴어인거 알지’라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나를 남성으로 상정한 대화가 이어질 때, 이걸 어디서부터 짚어야 하나 싶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에 큰 절망감이 든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다른 MTF들이나 게이들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면 내 정체성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될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바보 같은 생각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눈에 보이는 게 다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말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모는 것은 참 쉬운 일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냥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거나 심하게는 욕을 하거나 공론화를 하면 될 일인가? 그렇게 하면 젠더퀴어의 인권이 조금 더 올라가나?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그냥 개인 한 명이 악마가 되거나 혹은 내가 유난 떠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둘 다겠지. 그래서 나는 절대 그 한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이 악의가 있어서 나를 은연중에 남성으로 놓고 대화를 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얼마 전 애인이 타로학원에서 ‘제가 논바이너리 젠더퀴어입니다’라고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건 네가 예전에 안 좋은 가정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논바이너리로 정체화를 하게 된 것이니 네 마음에 걸리는 것이 풀리면 시스젠더로 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다. 나도 같이 수업을 받고 있었기에 당연히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내가 그나마 애인만큼 충격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냥 인류 전반에게 내 정체성을 이해받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내 주위의 퀴어 친구들에게 그런 경험을 당할 때에는 그나마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나의 성별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경험을 겪게 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일 테다.
요즘은 그냥 절망감이 더 크다. 한때 이런 현실을 바꿔보겠다고 ‘트랜스해방전선’이라는 트랜스젠더퀴어 인권단체에서 활동도 했지만, 활동하면서도 내 개인적인 부분들은 전혀 해결이 되지 못했고 그 사이에 건강만 악화됐다(물론 이게 해당 단체 탓만은 아니다). 당분간은 어떠한 활동도 못 하겠다는 판단이 들어 2020년 현재는 모든 분야의 활동을 쉬고 있다. 하지만 건강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아마도 예전처럼 다시 현장에서 함께하는 활동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내 개인, 이오 한 명이 단체와 함께하며 일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작은 반면 활동을 하면서 내 정신 건강을 해칠 요소들에 노출되는 상황은 활동하지 않을 때에 비해 훨씬 잦을 것이기에.
사실 이와 비슷한 결의 글을 기홍이 하늘로 간 날에 쓰려고 했었다. ‘논바이너리는 남들과는 다를 뿐 틀린 정체성이 아님을 내가 살아가면서 보여주겠다’는 내용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 이를 악물면서 다짐했던 희망도, 약간 젠더퀴어 희망편? 같은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 같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 작년 11월부터 일을 쉬는 동안 타로를 배우고 다이어트를 약간 한 것 빼고는 뭔가를 더 하지 못하고 게임에만 매달렸다. 그 이유도 그동안 내가 밖에서 살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았기에, 그 밖을 최대한 보고 싶지 않아 모니터 속으로 도망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건강이 안 좋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무력감이 덕지덕지 붙은 것 같다. 퇴사 직후보다는 그럭저럭 나아졌지만 내 무력감은 아직도 많이 빠지지 않았다. 무력감이 빠져야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걸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무력감이 빠지는 걸까. Exercise이건 Movement이건 간에 둘 다. 이대로 가다가는 둘 다 평생 손 놓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이대로 살다가 무기력하게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나는 나답게, 나대로 살고 싶다. 아직 내가 나답게 살고 나답게 제명을 다 하고 죽어서 젠더퀴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도 ‘꼭 그렇게 증명을 해야만 젠더퀴어라는 정체성이 옳은 것이 되는가.’ ‘내가 뭐라고 나 하나가 잘살았다는 걸로 젠더퀴어가 잘살았다는 것을 대표할 수 있는가.’ 등의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이 생각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최근 연이은 부고 소식을 겪으면서 연락을 준 나의 친구들을 봤기 때문이다. 젠더퀴어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나였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다. 물론 그만큼 젠더퀴어가 얼마 없기 때문이긴 하겠고 그 중에 나처럼 반쯤 오픈리로 사는 사람은 더욱 없기 때문이겠지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하늘나라로 가지 않을 첫 번째 이유는 애인과 잘살아야 하기 때문이지만 위에서 말했던 이유 때문에라도 억울해서 쉽게 죽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아직도 내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내가 나를 부정당한다고 느낄 때마다 ‘그건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시끄럽고 불편하게 만들며 살아야 할지, 아니면 예전처럼 웃는 낯으로 적당히 이야기하고 나 혼자 또 마음을 찢어가며 속 시끄러워 하면서 살아야 할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젠더퀴어는 오늘도 여기 있고
젠더퀴어는 틀린 것이 아니며
젠더퀴어를 남성 혹은 여성으로 보는 건 아주 아주 아주 나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본 여러분, 제발 나를 남자의 위치에 놓고 생각하거나 대화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제가 젠더퀴어라는 것을 한번만 더 생각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저는 뒤에서 죽어간답니다.
Written by 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