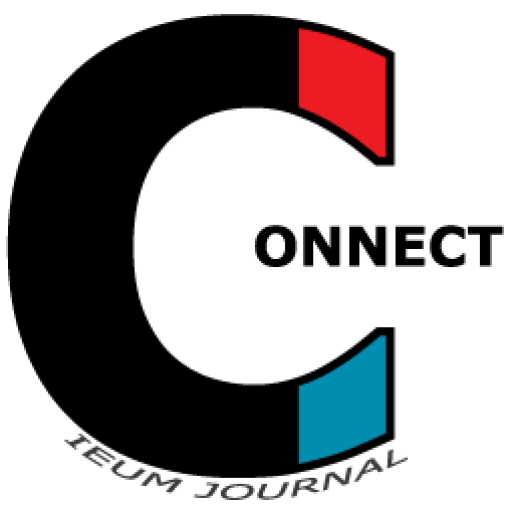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내언니전지현과 나>를 보고 나서, 나는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졌다. “지금까지 했던 게임 중에서 가장 재밌게 했던 게임은 뭐예요?” 하고 말이다. 아마 각자 다른 게임이 나오겠지만, 나로 말하자면 집에 슈퍼 패미컴이 있던 세대로서(에헴) 어릴 적부터 ‘서커스 찰리’라든가 ‘슈퍼 마리오 3’ 등과 함께 자라난…… 뭐 그런 시대의 사람이다. ‘버츄어 파이터’의 폴리곤 그래픽을 보고 놀라워했고, 동생과 나란히 앉아서 ‘보글보글’이나 ‘뿌요뿌요’를 하다가 주먹다짐(!)을 벌이기도 했고.

그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도 정말 열심히 했었다. 가장 열심히 했던 게임을 꼽으라면 지금도 서비스하고 있는 ‘마비노기’나 ‘아스가르드’, 이제는 서비스를 종료한 ‘다크에덴’, ‘C9’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 최근에 깔짝거린 게임으로는 ‘검은 사막’ 정도가 있겠다.
그러니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하면 역시 ‘서커스 찰리’나 ‘슈퍼 마리오’ 시리즈 등을 꼽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근데 어째서인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은 ‘디아블로 2: 파괴의 군주’랑 ‘라그나로크 온라인’이다. ‘디아블로 2’ 같은 경우는 원래 청소년 이용불가라 내가 할 수 없는 게임이었지만! 아빠의 권력을 이용해 구입할 수 있었고 정말 미친 듯이 했다. 엄마아빠 몰래 밤새 게임을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마우스를 쥐고 졸았을 정도…? ‘라그나로크 온라인’도 그만큼 정신없이 했던 기억이 난다.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트리 오브 세이비어’도 클로즈 베타를 신청해서 플레이했으니까… 흑흑. (아는 사람만 알 테지, 이 슬픔.)


<내언니전지현과 나>에서 지금까지 ‘일랜시아’를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런 게 아닐까. 이 영화에서 다루는 ‘일랜시아’라는 게임은 넥슨에서 199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2D MMO RPG 게임인데, 솔직히 말하면 난 해본 적은 없다. 그 당시 유명했던 ‘바람의 나라’와 ‘어둠의 전설’도 해보지 못했다. 왜냐면 그땐 집에 컴퓨터가 없었어서. 대신 영화 속에 비교군으로 등장하는 ‘아스가르드’는 한때 열심히 했었다.
 아아, 너무나도 그리운 UI 디자인.
아아, 너무나도 그리운 UI 디자인.
근데 나는 이 게임들을 대체 왜 그리워하는 걸까? 지금 나오는 게임들에 비하면 그래픽이 훌륭했던 것도 아니고 게임성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게임 속에서 사귄 친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특별한 추억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나의 이 질문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내언니전지현’님이 여전히 ‘일랜시아’를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게임 왜 하세요?”

사실 “게임 왜 하세요?”라는 질문에는 이미 원사운드가 걸출한 (…) 대답을 내놓은 바 있다.
 시바… 게임하는 데 이유가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시바… 게임하는 데 이유가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그렇다. 이미 우리에게 이유 따윈 없다. 사실 <내언니전지현과 나>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말한다. 다른 게임과 비교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20세기의 구식 게임. 거기다 ‘심지어 운영자조차 버린 망겜’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일랜시아’를 플레이할 이유 따윈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게임을 하다못해 불만사항을 접수하러 넥슨 본사까지 찾아가고, 지인을 사칭한 캐릭터한테 사기까지 심하게 당했는데도 여전히 게임을 접지 못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랜시아’는 이미 한때 플레이하다 마는, 스쳐지나가는 게임이 아닌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이리라. 이미 자신의 삶 속 한 부분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버린 것이리라. 난 그게 무엇인지 너무 잘 알 수 있었다. 내가 ‘디아블로 2’와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은 그 감각들. 새벽에 혼자 게임을 플레이하다 게임 속에서 그래픽으로 구현된 햇살을 느꼈던 순간들. 사냥을 하다 말고 풍경이 예쁜 곳에 앉아 스크린샷을 찍고. 프론테라 앞마당에서 하릴없이 그저 앉아서 게임 속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일러스트가 예쁜 NPC에게 괜히 말을 또 걸어보기도 하고. 게임 속 골드를 모으고 모아 마침내 사고 싶던 아이템을 샀을 때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게임 속 내 캐릭터를 연습장에다 수없이 그려보기도 하던 그런 날들. 누군가에겐 한낱 그래픽 쪼가리였을 수도 있겠지만 게임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나는 그 캐릭터의 일부분이었고 게임을 벗어나면 그 캐릭터는 내 안에 살아 숨쉬었다. 그건 아마 깊숙하게 게임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감각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순간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순간들 때문에.
하지만 단순히 ‘일랜시아’만의 이야기였으면 <내언니전지현과 나>는 그렇게 좋은 다큐 영화로 남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깟 게임 이야기가 뭐라고…” 하며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과몰입하여 “게임은 인생이지!”라고 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언니전지현과 나>는 그 두 관점을 모두 담고 있다. 말하자면, “이깟 일랜시아가 뭐라고…… 근데 나한테 이 게임은 인생인 거 같아.” 하는 태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 진지한 태도로 ‘일랜시아’를 대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넥슨 본사에 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리라. ‘일랜시아’에, 그리고 ‘일랜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과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애정 그 이상의 감정을 담고 있었기에. 누군가 내게 이 사람들만큼의 열정이 있냐고, 이 정도의 열정을 쏟을 만한 대상이 있냐고 묻는다면 나는 고개를 끄덕일 자신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나는 ‘마님은돌쇠만쌀줘’ 길드원이 부러웠다. 지금이라도 ‘일랜시아’를 시작하면 저 길드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할 정도로 부러웠다. MMO RPG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게임을 접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좋은 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니까.

이 영화의 엔딩크레딧에는 <내언니전지현과 나> 제작에 큰 도움을 준 길드원들의 아이디도 나온다.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인데도, 어쩐지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언젠가, 내 곁을 스쳐지나간 사이버 인연들에게 당당하게 바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Written by 박봉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