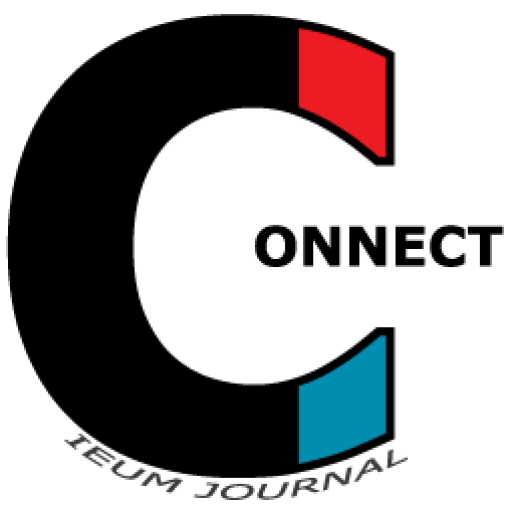지난번 글(“어떤 언어는 다른 언어보다 논리적인가”)에서 우리는 “한국어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통념적인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한국어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근거로 흔히 제시되는 예문들이 사실은 어느 언어에서나 흔히 나타나는 환유와 구조적 중의성 현상의 한 형태임을 보였다. 이번 글에서도 우리는 논리나 언어의 개념에 대한 정교한 검토를 살짝 피하여, 한국어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또 다른 형태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주장은 한국 사회는 고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 사회에 속하고, 고맥락 문화는 저맥락 문화에 비해 논리적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이다. 고맥락 문화, 저맥락 문화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주창한 개념인데, 이에 따르면 이 두 문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고맥락 문화는 대화를 진행하는 바탕, 즉 문맥을 만들기 위해 많은 언어사용이 필요치 않고 이미 사회적으로 문맥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저맥락 문화는 대화의 문맥을 만들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하고, 모든 문맥은 대화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차이를 구체적인 예로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텍스트는, 다소 뜬금없지만 작고한 한국의 칼럼니스트 이규태 씨의 다음 칼럼이 아닌가 한다.
이규태 “헛기침으로 백 마디 말을 한다”
(…) 우중충한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며느리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 채 다림질을 하고 있다. 이웃 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말을 건네 온다.
“아가, 할미가 업어 줄까?”
이 말은 할미가 젖을 빠는 손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비가 뿌리는 밖에 널려 있는 빨래를 빨리 거둬들이라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분부인 것이다. 며느리는 그 말을 통찰력으로 알아듣고 빨래를 거둬들인다.
텃밭에 가 남새 뜯어 국거리 마련하랴, 저녁밥 지으랴, 애들 돌보랴, 일손이 바쁜 며느리는 시어머니 담배 피고 있는 방 앞에서 강아지 배를 차 깨갱거리게 하거나 마루에서 노는 닭들에게 앙칼스레 욕을 퍼붓는다. 시어머니는 ‘옳거니.’ 통찰로 그 뜻을 알아차리고 바구니 들고 남새밭에 가면 되건만, ‘그렇지 않아도 좀 쉬었다가 텃밭에 가려고 했는데 강아지 배때기를 차……. 어디 가나 보라.’고 버티고 있으면 며느리는 업힌 아이보고,
“니 어머니는 무슨 팔자로 손이 세 개 달려도 모자라냐.”
고 혼잣말을 한다.
이 같은 통찰을 필요로 하는 대화를 서구식으로 통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화로 통역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나는 아이 업고 밥짓기가 바쁘니 나를 돕는 뜻에서 바구니 들고 남새밭에 가 국거리 좀 뜯어다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응, 그러마. 나 지금 담배 한 대 피고 있으니 다 피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약 5분만 기다려 다오.”
“좋아요. 5분 후에는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길 바래요. 꼭요.”
“알았다. 그렇게 하마.”
가정에서부터 나라라는 큰 집단까지 한국인은 너무 많이 통찰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이 통찰이 부드럽게 이뤄지면 빨래 걷는 며느리처럼 충돌 없이 행복하게 영위가 되지만, 남새밭에 가지 않는 시어머니처럼 통찰이 어긋나면 증오와 불화가 빚어진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지피는 장작불의 조잡함에서, 며느리가 먹인 시어미 삼베고쟁이의 칼날같이 뻣센 풀에서 며느리의 반항을 통찰할 줄 알아야 한다. 며느리가 업고 있는 아이의 울음의 질과 시간과 때와 경우를 판단하여 며느리가 아이 엉덩이를 꼬집어 울린 건지 아닌지를 통찰로 감식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 하면 꼬집어 울리는 아이의 울음이나 배를 차서 울리는 강아지의 울음은 불만이 차 있는 며느리의 절규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플라스틱이라 소리가 나지 않지만 바가지 요란하게 긁는 것이, 통찰이란 미디어를 통한 강력한 발언인 것이다. 한국인은 이렇게 눈이나 귀가 입보다 말을 많이 한다. (…)
이 칼럼은 비록 사실 고맥락/저맥락 개념이 웅변해 주는 학적 사실을 아주 정교하게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개념을 즉물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을 준다. 곧 고맥락 문화란 ‘헛기침 한 번’을 하는 문화요 저맥락 문화란 ‘백 마디 말’을 하는 문화인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문화 분석에서든 한국 문화는 고맥락 문화로 간주되어 왔다.
이 지점에서 자신의 양친이나 교사나 직장 상사와의 의사소통 경험을 떠올리며 비명을 지르는 독자도 있을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 기억이 한국어로는 논리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언어라는 인식에 한 표를 더해 주는 경우도 많으리라. 그런 독자들이 입을 모아 역시 한국어는 비논리적인 언어라고 토로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우리 역시 그런 토로에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
지난 시간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이 글은 ‘논리적’이라는 개념의 분명한 정의 없이, 이 단어가 가진 일상적인 인상에 기대어 진행되고 있다. 논리적이라는 단어의 우리의 일상적인 인상은 어떠한가? 대체로, 메시지가 모호해지는 일 없이, 할 수 있는 한 한껏 언어가 명료화된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일테면 위의 칼럼에서 칼럼니스트가 인위적으로 저맥락화(?)해 만든 문장인 “나는 아이 업고 밥짓기가 바쁘니 나를 돕는 뜻에서 바구니 들고 남새밭에 가 국거리 좀 뜯어다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응, 그러마. 나 지금 담배 한 대 피고 있으니 다 피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약 5분만 기다려 다오.” 따위가 우리에게는 논리적인 언어 표현들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맥락 문화는 비논리적 언어 표현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문화이고 저맥락 문화는 논리적 언어 표현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문화라고 말해도 일상적인 수준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짚어 두어야 할 점은, 고맥락/저맥락 문화 담론은 언어 담론이라기보다는 언어를 둘러싼 더 큰 개념인 문화의 담론이라는 것이다. 즉 이 담론에서 주장하는 바는 한국어가 고맥락 의사소통 언어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고맥락 의사소통을 즐겨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칼럼니스트가 인위적으로 구성한 것처럼, 하려고만 한다면 ‘저맥락 의사소통’도 한국어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현실에서 한국어로 논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사회문화적 질문이 던져진다면 우리는 위의 논의에 의거하여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겠지만, 만약 한국어로 논리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하는 기술적 질문이 던져진다면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없다. 지난번 글에서 살핀 바와 같이, 논리적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요인이 한국어 안 어딘가에 있다면, 적어도 그것은 한국어 어휘나 문법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차후 기회가 있다면 한국어로 논리적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을 촉진하거나 저지하는 한국어 내적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기술적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Written by 아무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