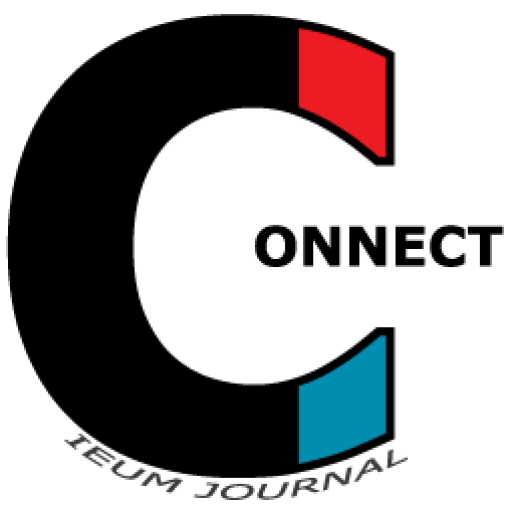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이 글은 영화 <레이디버드>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이디버드>를 상당히 뒤늦게 보았다. 2018년 4월에 개봉했는데 극장은 고사하고 넷플릭스에 들어왔을 때도 계속 뒤로 미루다 결국 2020년 3월 10일, 넷플릭스에서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란 트윗을 보고서야 딱 그날에 봤다. 왜 그랬을까?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잦다. 보고 싶다며, 꼭 보겠다며 개봉 전부터 설레발을 치다가 예매도 하지 않은 영화. 내려온 극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며 2회차를 예매하려다 금전적 사정으로 그만둔 뮤지컬. 재밌겠다 하며 구입해놓곤 펼쳐보지도 않아 매 페이지가 반질반질한 책 등이 내 뒤에 무수히 쌓여 있다. 사실 그날 <레이디버드>를 보지 않았더라면 이 영화도 그렇게 흘러갔을 터인데.

영화에 대한 평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재밌었다. 볼 만했다. 하지만 10대 때 봤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었다. 나는 ‘레이디버드-크리스틴’에게 쉽게 공감할 수가 없었다. 어떤 행동들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너무…… 철없어 보였다. 영화를 보는 내내 나는 십대 때의 나와 현재의 나를 오가야만 했다. 그게 괴로웠다. 목욕탕의 냉탕 온탕을 오가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지금의 미국 여자애를 다루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 나도 재미없고 꼰대 같은 어른이 되었나 싶어서 뒷맛이 썼다.
그 쓴맛의 시작에는 ‘줄리’가 있었다. 친구도 없이 홀로 다니는 ‘크리스틴-레이디버드’와 항상 함께 다니는 ‘줄리’에게 나는 더 눈길이 갔다. 이 영화에서 ‘줄리’의 역할을 말하자면 패리스 힐튼 옆에 있던 킴 카다시안, 혹은 <퀸카로 살아남는 법>의 레이첼 맥아담스 옆에 있던 아만다 사이프리드. 아니면 그 이하일 수도 있다.
 ‘크리스틴-레이디버드’와 ‘줄리’
‘크리스틴-레이디버드’와 ‘줄리’
‘크리스틴 맥피어슨’이 연극부 오디션 신청서에 자신의 이름을 ‘크리스틴-레이디버드’라고 적자 ‘줄리안느 스테판’ 또한 인용부호를 달아 ‘줄리’라고 쓴다. 그걸 본 ‘크리스틴-레이디버드’가 인용부호를 빼도 된다고 이야기하자, “이것도 내 예명인데?”라고 답한다. 그러자 ‘크리스틴-레이디버드’가 이렇게 말한다.
“나랑 넌 다르지.”
‘크리스틴-레이디버드’의 이 말은 이 영화에서 ‘줄리’의 위치를 드러내주는 단적인 예다. 그러나 거기에 ‘줄리’는 이렇게 응수한다.
“그건 네 생각이지.”
맞다. 그건 ‘크리스틴-레이디버드’의 생각일 뿐이다. 같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줄리’도 나름의 자아형성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옆에 너무나 강한 개성을 뿜어내고 있는 ‘크리스틴-레이디버드’가 있어서 아무도 ‘줄리’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줄리’는 어쩌면 ‘크리스틴-레이디버드’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주인공이 아닌 ‘줄리’의 삶. 일단 유색인종이다. 뚱뚱하고,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크리스틴-레이디버드’보다 더 가난하게 산다. 부모는 이혼했고, 자신에게 잘 대해주던 엄마의 새 남친도 떠나갔다. 자신을 ‘줄스’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잘 대해주던 수학 선생을 좋아하게 되었으나 그 선생에게 실연 아닌 실연을 당한다. 하나밖에 없는 친구는 남자 애인이 생기거나 잘나가는 여자애와 친해질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신을 외면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땐 찾는다.
그러나 ‘줄리’는 티를 내지 않는다. 주인공이 아니기에 티를 낼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도 했지만, 어쩌면…… 티를 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뒤늦게 ‘크리스틴-레이디버드’가 ‘줄리’에게 한 잘못을 깨닫고 집에 찾아왔을 때, ‘줄리’는 울고 있었다. 왜 울고 있냐는 물음에 ‘줄리’는 이렇게 답한다. “그냥…… 원래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
‘줄리’에겐 그런 순간들이 많았을 것이다. 단지 보이지 않았을 뿐. 나는 이 장면을 보고 나서 내가 ‘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크리스틴-레이디버드’가 아니고 ‘줄리’였을 텐데. ‘크리스틴-레이디버드’가 되고 싶은 ‘줄리’였을 텐데. 언제나 그렇다. 내가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조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디버드>에서 진짜로 중요한 캐릭터는 ‘줄리’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레타 거윅 감독도 ‘줄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이름이 적인 연극부 오디션 배역발표지를 ‘크리스틴-레이디버드’ 몰래 조심스레 매만지는 장면 등을 보고 그렇게 느꼈다. 그렇지만 ‘줄리’는 결국 마지막까지 ‘주인공의 베스트프렌드’ 역할에 충실하다. ‘크리스틴-레이디버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주는, 좀 더 신랄하게 말하면 주인공인 ‘크리스틴-레이디버드’의 친구나 우정에 대한 면모를 부각시켜야 할 때마다 등장하는. 음, 그게 아쉬웠다. 너무 아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디버드>를 보고 나서, 나는 ‘줄리’에 대해 쓰자고 마음먹었다. 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나 진지하고, 길게 쓰고 말았다. ‘줄리’였던 내가 생각나서. ‘줄리’일 수밖에 없는 내가 슬퍼서. 여전히 어디서 누군가의 ‘줄리’일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어서. 한때 ‘줄리’였던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크리스틴-레이디버드’가 아니더라도 ‘줄리’에게는 ‘줄리’만의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언젠가 스핀오프처럼 ‘줄리’의 이름을 단 영화가 나오길 바라며.

Written by 박복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