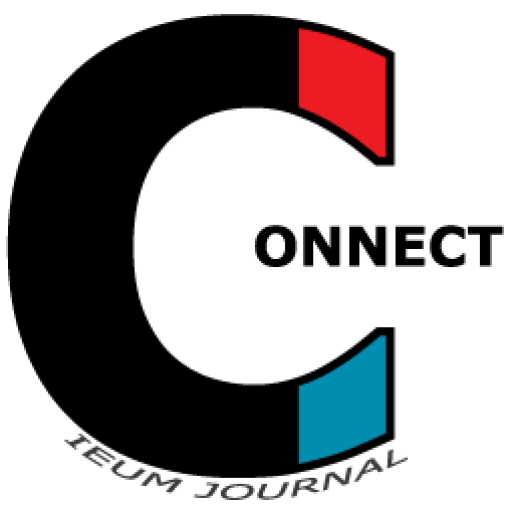우리가 살면서 간간이 듣게 되는 명제가 있다. “한국어는 논리적이지 않다” 또는 “한국어는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한 인터넷 유명인이 트위터에서 한국어는 논리적 구조를 짜기 어려운 언어라며 이 오래된 명제를 재생산하였고, 아주 잠시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기도 했다.
간단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따지려 들면 짚어야 하는 전제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도대체 언어가 논리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담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논리’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쓰고 있는가? 그것은, 일테면, 학문 분과로서의 논리학과 관계 있는 것인가? 공학 분야에서의 논리 설계와 관계 있는 것인가? 아니면, ‘논리’라는 단어가 가진 막연한 – 합리적인, 분별 있는, 차가운 – 이미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언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짚어야 한다. ‘한국어가 논리적인가’라고 할 때 ‘한국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어 문법을 말하는가? 문체를 말하는가? 어휘를 말하는가? 세월이 축적한 한국어 텍스트들을 말하는가? 한국어 사용자들의 일반적 성향을 말하는가? 구어와 문어 전체를 말하는가, 그 중 어느 한 쪽만을 말하는가? 이 범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또한 한국어의 논리성을 의미있게 따지기 어렵다.
이런 전제들을 차근차근 밟아 가며 언어와 논리의 관계를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은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니 훗날로 미루고, 오늘의 짧은 글에서는 ‘한국어는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할 때 거론되는 문장 몇 가지를 가지고 그 문장들이 과연 한국어의 특성을 드러내 주는 것인지 살피는 일에 만족하기로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어는 언어 표현의 지시 대상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인 텍스트를 구성하기에 미흡한 도구라고 말한다. 이들이 한국어가 논리적이지 않다고 드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Q:주문은 뭘로 하시겠어요?
A: 저는 짜장면입니다.
위 문장을 근거로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논리 구조가 엉망인 문장이다. 사람이 어떻게 짜장면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문장으로 의사소통하는 한국어는 논리적인 언어일 수 없다.” 곧이어 다른 언어와 견주어 이렇게도 말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다른 언어(일테면, 영어)는 논리적인 언어이다. 영어 대화라면 절대 위와 같은 문맥에서 “I’m a ham sandwich.”와 같은 문장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 사실이기는 하다. 영어라면 위와 같은 문맥에서 “I’m a ham sandwich.”라는 문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 구어 문장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영어에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A. The ham sandwich in the corner wants more coffee. (Denroche, 2009)
(햄 샌드위치를 주문한 손님이 커피를 더 달라고 하고 있다는 뜻)
A. John is the ham sandwich. (Ibanez, 2012)
(John이 바로 햄 샌드위치를 주문한 사람이라는 뜻)
A. I’m reading Shakespeare.
(Shakespeare의 작품들을 읽고 있다는 뜻)
A. I’m parked out back.
(나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뜻)
위 영어 문장을 보면, A, B에서는 ‘Ham sandwich’라는 언어 표현이 ‘Ham sandwich를 주문한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 C에서는 ‘Shakespeare’가 ‘Shakespeare의 작품’을 대신하고 있으며, D에서는 ‘I’가 ‘나의 자동차’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 사용은 한국어에서 식당에서 주문 메뉴를 물을 때 “저는 짜장면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표현 사용의 세부적, 구체적 관행이 한국어권과 영어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언어 표현을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을 흔히 환유(換喩, metonymy)라고 부른다. 환유란 연관성, 인접성을 연결고리로 하여 한 언어 표현이 다른 언어 표현을 대신하는 현상을 말한다. ‘짜장면을 주문한 사람’과 ‘짜장면’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 ‘햄 샌드위치를 주문한 사람’과 ‘햄 샌드위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연관성이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것으로 인식되면, 두 표현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게 되어, 자연스럽게 길고 복잡한 표현보다는 짧고 단순한 표현을 택하게 된다. 이는 모든 인간의 언어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며, 한국어에서 고유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한국어가 논리적인 텍스트를 구성하기에 미흡하다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로는 일부 문장 구조에서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애매해진다는 것이 있다. 이런 주장에서 거론하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이 문장에서 ‘보-’의 의미상의 목적어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다. 즉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는 많은 학생’의 뜻으로 읽힐 수도 있고 ‘많은 학생을 보고 싶어하는 선생님’의 뜻으로 읽힐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례를 근거로 “문장을 보고 그 뜻을 오해 없이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한국어는 논리적 텍스트를 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한국어가 비논리적이라는 증거가 되는가를 떠나, 이 현상 또한 한국어에서 고유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는 구조적 중의성(構造的 重義性, structural ambiguity)이라고 불리는, 역시 언어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구조적 중의성은 겉보기에 동일한 두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구문 구조로 해석될 수 있을 때 발생한다.
“I saw someone on the hill with a telescope.”
해석 A: 나는 망원경으로 언덕 위의 누군가를 보았다.
해석 B: 나는 망원경을 가진 언덕 위의 누군가를 보았다.
해석 A, B는 with a telescope가 saw와 밀접히 결합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someone on the hill과 밀접히 결합된 것으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갈리는 것이다.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어순으로 나열된 두 문장이라도 양쪽의 의미는 다를 수 있다. 단어들이 결합되어 문장을 이루는 방식, 즉 구조(structure)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화학에서 이성질체(異性質體, isomer)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다.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도, 분자를 이룰 때 결합하는 구조가 다르면 최종적으로 전혀 다른 물질이 될 수 있듯이, 구성하고 있는 단어와 그 어순이 같아도 최종적으로는 다른 문장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어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에 근거로 동원되는 예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간단히 환유와 구조적 중의성이라는 두 가지 현상만을 거론해 보았다. 논리적인 언어와 논리적이지 못한 언어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단지 자주 거론되는 그 현상들이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널리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다. 다른 기회에 좀더 폭넓은 현상에 대해 다루기를 기약한다.
Written by 아무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