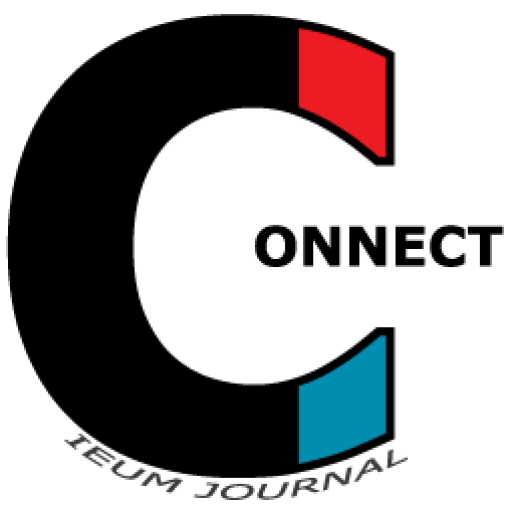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이 글은 영화 <미드소마>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포영화 특유의 분위기를 좋아한다. 매니아를 자청할 정도로 즐겨 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본다. 원체 겁이 많다. 그래서인지 깜짝 깜짝 놀라게 하는, 소위 ‘점프스케어’가 있는 영화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매우 싫어한다. 이를 심하게 남용하는 공포영화들은 공포영화 범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사실 점프스케어는 공포영화 기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관객의 입에서 ‘무서워’라는 말이 나오게 하려면 무언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란 말은 가장 쉽다는 말도 된다. 이렇게 만드는 건 쉽다.

이렇게는 누가 못하냐(…)
그래서 점프스케어 없는 공포영화를 찾는 게 힘들다.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9년 현재 공포영화 감독 중에서 탑이라고 칠 수 있을 만한 제임스 완의 경우, <컨저링 유니버스>에서 점프스케어를 갖고 논다. 물론 이 감독은 매우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공포감을 더해주지만. 하지만 그래도 점프스케어가 많이 나오는 공포영화는 싫다. 심장이 죄어드는 느낌이 좋아서 공포영화를 즐겨보는 건데, 점프스케어가 나오면 누군가 내 심장을 갑자기 콱! 쥐었다 놓는 것 같다. 그런 상태를 계속 겪다보면 기진맥진해진다. 좋은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의 기진맥진함과는 다르다.
하지만 점프스케어 없는 공포영화는 분명히 있다. 이런 영화들을 일명 ‘점프스케어 프리’ 영화라고 부른다. 워낙 드물어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소규모로 리스트를 돌리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있다. 그것도 잘 만든 점프스케어 프리 영화가 있다.
이런 점프스케어 프리 영화의 시발점은 어딜까? 모든 공포영화를 섭렵하지 않은 터라 어떤 영화라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처음 본 점프스케어 프리 영화는 <블레어 윗치>였다. 그래, 그 <블레어 윗치>. 1997년에 개봉하여 전 세계를 휩쓸고, 무려 ‘파운드 푸티지(Found Footage)’라는 영화 장르까지 새로 탄생시킨 바로 그 영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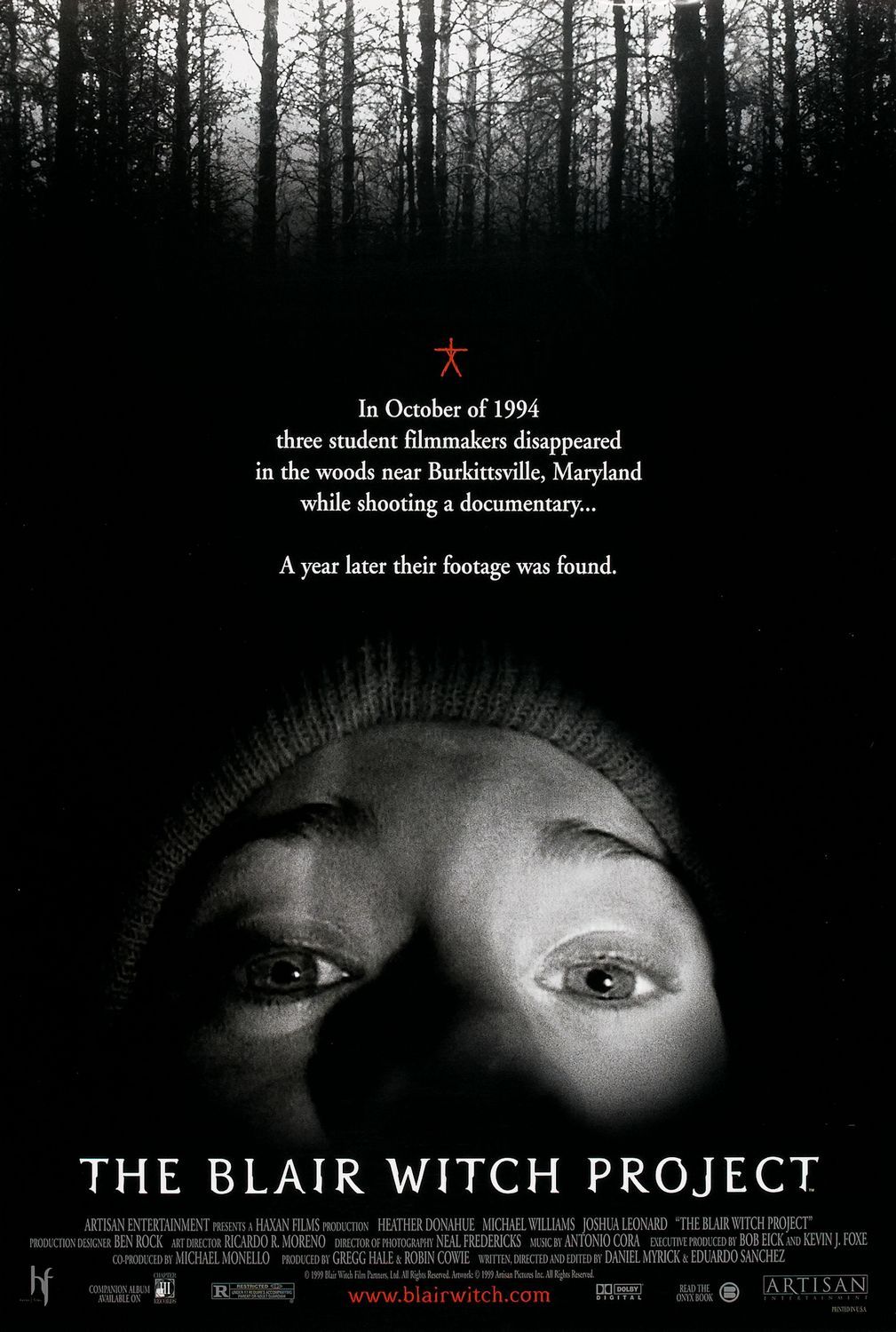
지금 생각해보면 엔딩에 점프스케어 장면을 하나 정도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영화는 분위기 그 자체로 무서웠다.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런 공포영화였다. 괴기한 일이 자꾸 일어나지만 의문은 쌓이기만 하고, 풀리는 건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나 자신조차 의심하게 되어버리는. 그렇게 나는 점프스케어 프리 영화를 하나 둘씩 격파(?)해갔다. <더 위치>, <바바둑>, 그리고 10월에 감독판이 새롭게 개봉한 <미드소마>까지.

<미드소마>의 감독 아리 애스터는 이미 <유전>이란 이름의 걸출한 공포영화를 내놓으며 데뷔한 바 있다. <미드소마>의 가장 대단한 점은 점프스케어 프리 영화인 동시에 모든 사건이 밝은 낮에 일어나는 일명 ‘대낮 공포’를 표방한 영화란 것이다. 공포영화에서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요소인 ‘깜놀’과 ‘어둠’을 하나씩 뒤집었다. 그런데도 정말 무섭다. 심지어 저렇게 꽃이 만발한 초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정말 너무너무 무섭다.
왜일까? 일단 첫 번째로는 BGM의 뛰어난 활용을 꼽고 싶다. 누군가 아리 애스터를 가리켜 ‘브금 맛집’이라 했다. 이 말이 딱이다. 공포영화의 음악이 분위기를 많이 좌우한단 사실을 다들 알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높이 떠오른 태양이 눈부시다. 마주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웃고 있다. 꽃들은 활짝 피어 있고 무료할 정도로 평화로운 분위기. 그러나 자꾸만 긴장된다. 어쩐지 뭔가 하나씩 비틀려 있는 것 같다.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버릴 것만 같은 아슬아슬함, 조마조마함. <미드소마>의 BGM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다루고 있는 대상들 또한 신선하다. 덴마크 시골마을에서 벌어지는 여름 축제. 비밀스런 사교 집단들. 아직도 지구 한구석에서는 은밀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신공양 풍습들. 전부 우리가 얼추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것들이다. 아, 대강 아는데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은 사실 무서운 일이다. 우리의 공포는 어설프게 아는 데서 시작된다.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안다. 그러나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 ‘미드소마’라는 축제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도 이 영화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지 않은가. 물론 영화 속 축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지만. 사교 집단들? 토요일 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틀기만 하면 나오는 것이 사교 집단들이다. 인신공양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것이 원시적이고 비인간적인 일이라고 분개하지만 아직도 지구 한구석에서는 은밀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인도에서는 아직도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도 남편의 시체와 함께 화장시키는 ‘사티’라는 악습이 남아 있다. 지난 2018년에는 멕시코 테노치티틀란에 있는 아즈텍 부족의 피라미드에선 ‘촘판틀리’라는 이름의 해골탑이 발견되었다. 지름이 6m에 이르는 이 촘판틀리에는 약 13만 6,000개의 해골이 꿰어져 있다고. ‘미개’하다고? 당장 우리나라 전래동화 ‘심청전’만 해도 심청이가 인신공양으로 바쳐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어우러져 <미드소마>라는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다.

무엇이 진짜 좋은 공포영화일까? 속 시원히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앞부분에서 점프스케어 기법을 차용한 영화들을 비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점프스케어를 잘 활용한, 예를 들어 <컨저링>이나 <REC>, <아이덴티티> 같은 영화가 진짜 좋은 공포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드소마>는 좋은 공포영화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고정되어 있던 장르의 문법을 높은 완성도로 뒤집은 영화이기 때문이다.

이 사진은 아리 애스터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이다(…)
그의 다음 영화가 궁금하다. 정말로(…)
Written by 박복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