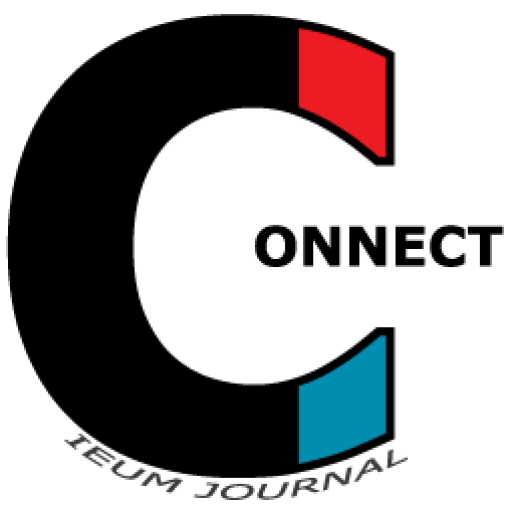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 인연의 시작
2018년 늦가을, 며칠 전부터 몸이 너무나 이상했다. 몸살감기 기운과 함께 온몸이 묵직하고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었다.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서 해보았다. 결과는? 두 줄이 나왔다. 두 줄이 의미하는 것이 무언지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한다. 사실 계획에 없는 임신이었다. 게다가 이미 우리에겐 두 명의 아이가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다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천천히 구상 중이었는데 모든 계획은 다시 원점이 되어버렸다. 사실 셋째 아이는 생기면 낳지만 일부러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혹스러웠다. 위장병이 생겨서 몸도 안 좋은 상태인데 임신 중에 버틸 수 있을까 고민도 되었고, 먹던 약이 많아서 아기의 건강도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지금 아기는 너무나 잘 자라고 있다.
2018년 11월 25일 이렇게 당혹스러운 첫 만남,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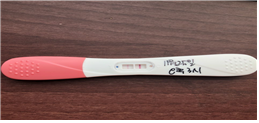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태명은 ‘깜짝이’ 가 되었다. 안녕? 깜짝아! 엄마야.
- 쏟아지는 말들
셋째를 가진 것을 알고 난 뒤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고, 가장 고민했던 ‘주변인에게 알리기’가 시작되었다. 친정에는 내가, 시댁에는 남편이 각자 알아서 알렸다. 나는 부모님에게 핀잔과 걱정을 들었으며 남편도 마찬가지로 걱정 섞인 말들을 들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씁쓸했다.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은 상태라 더 그런 것임을 알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지만 ‘잘 키우면 되지 뭐!’ 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엄청난 말들을 감당해야 했다. 그중 충격적인 목록을 풀어보자면
1) 남편 직장 상사 a: “아이고 그러기에 조절 잘하지 그랬어?” 그 옆에 나도 있는데?
2) 남편 직장 상사 b: “바쁜 와중에 열일 하셨구먼.”
3) 식물 동호회 카페 댓글: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십니다.”
4) 어린이집 원장님: “어머 어머니 애국자세요.”
둘째 어린이집 입소 상담을 하러 갔던 자리였는데 원장님이 이야기하는 ‘애국자’라는 말에 인내의 끈이 토옥 하고 끊어졌다.
“저 애국하려고 셋째 낳는 게 아니라 제가 낳아서 잘 기르는 거죠.”
한국이 저출산 국가이다 보니 여자들이 애국하려고 목숨 걸고 출산하는 ‘출산 다르크’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인가. 내 자궁이 공공재냐? 그 놈의 애국! 애국! 애국! 그 소리가 그렇게 거슬렸다.
난 셋째 출산=애국자 뭐 이런 공식이 있는 줄 알았다. 모두에게 애국자로 낙인찍히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제발 그냥 우리 부부의 결정에 축하한다 그 한마디 먼저 건네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녕 아무도 없는 것일까? 진심어린 축하가 정말 필요했다, 그게 우리 결정을 존중받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주변의 이런 상황에 있는 부부를 보거든 절대 다른 말보다 축하의 한마디를 건네주길 바란다.
- 내 배 좀 그만 보실래요?
2019년 4월 17일, 현재 나는 임신 7개월이 되었다.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누가 봐도 만삭의 임신부가 되었다. 임신은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임신 초기부터 시작되는 지독한 숙취와 같은 입덧과 골반 통증, 두통, 유방 통증, 팔다리 저림, 호흡 곤란. 거기다 새벽마다 소변 보러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야 하는지, 숙면도 힘들어지는 고난 중의 고난을 겪게 된다. 육아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인 나는 집안일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 늘 해야 할 일에 시달린다.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해서 컨디션에 맞게 잘 해내고 있는 중이다.
끝없이 펼쳐지는 육아와 살림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배불뚝이 아줌마인 내가 그렇게 안쓰러워 보이는 걸까? 얼마 전부터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유모차 끌고 아이 데리고 병원가기, 장보기, 산책하기 등을 할 때 주변의 시선이 내 배로 모이는 괴이한 경험을 하고 있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외출할 때 버스를 타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자리를 양보 받을 생각은 절대 해본 적이 없는데도 뒤뚱거리는 나의 걸음과 배를 빤히 쳐다보며 시선을 피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최대한 배를 가방으로 가리거나 잘 드러나지 않게 헐렁한 옷을 입고 다니곤 한다. 제발 그만 쳐다봤으면.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지 말았으면. 셋째라 배가 엄청나게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으니 임신 기간 동안 이렇게 지내야 하는데 어쩌란 말인가. 한여름에 출산할 예정이라 곧 있으면 옷으로도 가릴 수 없는 더운 날씨가 될 텐데 큰일이다. 그럼 더더욱 이런 불편한 눈길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유난히 한국은 남의 몸에 관심이 많다. 무례하게도. 대표적인 예로 ‘설리의 노브라’를 들고 싶다. 남이 브라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인지 그놈의 젖꼭지 타령을 해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빤히 쳐다보며 훈장질 하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 모른다.
불편한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내가 유일하게 배를 내밀고 자랑스럽게 다니는 곳이 집이랑 산부인과다. 이외의 곳에서는 나도 모르게 약간은 움츠리게 된다. 임신 중 배려 받으면 고마움을 느끼겠지만 이런 눈초리는 불편하다, 내 배 좀 그만 쳐다보시길.
- 이제는 나를 ‘자랑’할 때
지난 주말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님이 집에 올라오는 길에 3층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8월이면 셋째가 나와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란다. 그러자 이웃 아저씨가 엄청 놀라며 전혀 몰랐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그 다음날엔 내가 3층 아주머니의 축하를 받았다.
자, 이제 자주 마주치는 이웃도 모르게 숨겨온 나의 남산만 한 배를 자랑스럽게 까고 다닐 날이 온 것이다. 난 셋째 임신 사실을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딱히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나를 아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 받는 말들과 눈빛에서 자유롭고 싶었던 마음이랄까? ‘셋째 임신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기고문을 부탁받아 글을 쓰게 되었지만, 사실 이 글을 쓰면서 약간 마음의 짐을 덜게 되었다. 남편에게 말하고 받는 위로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해방감을 느낀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깜짝이 출산 예정일은 8월 4일. 오늘부터 위축되고 숨기고 싶었던 나의 아름다운, 내일이라도 당장 아기가 나올 것 같은 대문자 D 라인의 배를 까고 다니자.
남이 나의 배를 보며 이야기 하면 어때?(물론 너무 노골적으로 보면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질 것이지만) 이제는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게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나의 배를 자랑하자. 나는 사랑스러운 세 아이의 엄마가 될 거니까.
Written by 홍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