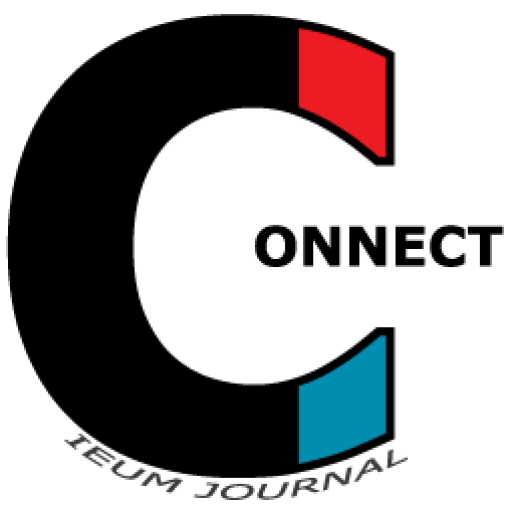일본에 와서 지낸 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해서인지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도 많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도 많았다. 내가 한국에 대해 사실은 잘 모르고 있구나, 하고 말이다.
명절에 관해서도 그랬다. 지독한 교통체증, 귀찮은 어른들의 잔소리, 평등하지 못한 일 분배……. 그런 것들로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 전통은 없어도 되는 게 아닐까 생각했고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알아보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다. 전통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말이다. 어떤 전통을 시작한 이유를 알게 되면 때에 맞춰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늘 하던 일이니 계속 한다는 방식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시작부터 잘못된 전통이라면 과감히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림책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본다.
『여우난골족』(창비)은 백석 시인의 시를 홍성찬 작가가 풀어 쓰고 그린 작품이다. 백석 시인의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를 배경으로 쓰인 작품이기에 풀어쓰는 작업과 그림으로 남기는 작업이 쉽지 않았던 듯하다. 오랜 세월 단절되어 살았던 곳의 언어와 풍습을 그림으로 살리기 위해 평안도 사람들이 이주해서 산다는 연변 산골 마을에서 설을 보내며 뼈대를 잡고, 평안도 실향민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점을 채웠다고 한다. 그렇게 탄생한 그림책 『여우난골족』은 전형적인 한국의 명절이 아닐까 생각되는 이미지로 가득하다. 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명절을 보낸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백석 시인의 원시는 처음 읽으면 도무지 어떤 장면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림책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겼을지도 모른다.
『여우난골족』이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솔이의 추석이야기』(이억배 쓰고 그림, 길벗어린이)는 1980~199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나에게는 그야말로 명절 그 자체로 느껴졌다. 아직 어둠이 가시기도 전 서둘러 버스터미널로 향했던 기억. 너무나 길이 막히자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쉬어가기도 했던 기억.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 집 저 집 인사 다닐 때 따라 다녔던 기억. 그리고 여자는 음식을 준비하고 남자들만 절을 하는 모습까지. 힘들게 돌아와 잘 도착했다고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잊고 있던 명절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림책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평등하지 못했던 시간들이다.
하지만 『우리우리 설날은』(임정진 글, 김무연 그림, 푸른숲주니어)에서의 명절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 모이는 가족 수도 적지만, 설음식을 만드는 일도 조상님께 절을 올리는 일도 놀이도 뒷정리도 모두가 함께 한다. 『솔이의 추석이야기』와 비교하며 달라진 점이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설이나 추석 이외의 명절 그림책도 있다. 『내 더위 사려!』(박수현 글, 권문희 그림, 책읽는곰)는 대보름에 더위를 팔지 못해 쩔쩔 매는 주인공의 모습을 비롯해 대보름에 행하는 의례와 놀이가 자세하게 나와 있다. 단오에 관한 그림책인 『청개구리 큰 눈이의 단오』(김미혜 글, 조예정 그림, 비룡소)는 창포 잎 사이에 껴서 어떤 집 부엌에 간 청개구리가 아슬아슬하게 탈출해서 보게 되는 다양한 단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한국의 문화라고는 하지만 농촌에 살지 않고는 접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그리고 요즘은 도통 입을 일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은 한복에 대한 책으로는 『비밀스러운 한복나라』(무돌 쓰고 그림, 노란돼지)와 『여자아이 고운 옷 설빔』·『남자아이 멋진 옷 설빔』(배현주 쓰고 그림, 사계절)을 보면 한복의 명칭과 입는 순서, 문양 등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림책 속 명절의 모습은 언제 어느 곳을 배경으로 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림책은 사라져 가는 문화를 기록하는 의미로, 지식을 전달하는 의미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 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는 그림책을 볼 수 있을까?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즐거운, 정말 그림책처럼 아름다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Written by 한일그림책교류회 강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