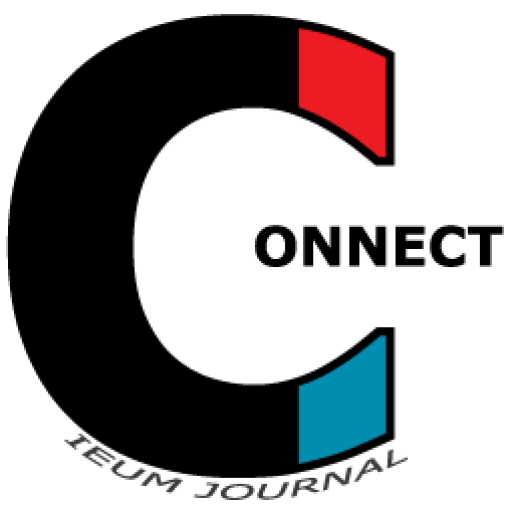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 여름에 먹는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름 아니라 물회입니다. 여러분, 물회 좋아하시나요?
세꼬시한 생선에 이런저런 채소를 곁들이고 빨갛고 달달한 살얼음 육수를 부은 한 그릇.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포항 식으로 생선회에 채썬 오이와 배를 고추장으로 버무려 먹다가 물을 부어 먹는 방식도 좋겠습니다. 소면도 말아 먹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식 물회를 아시나요? 그 동안 제주도 여행 바람도 꽤 오래 유지되었고, 방송에도 몇 차례 소개되긴 했지만 어떨까요. 제주도식 물회는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를 것도 같습니다. 네. 제 고향 음식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주도의 물회는 국물의 색이 빨갛지가 않습니다. 고추장이 아니라 된장을 써서 그렇습니다. 대접에 채 썬 오이와 뭔가 이것저것을 잔뜩 버무려두고 얼음과 된장육수를 자박하게 부어놓은 모양새입니다. 투박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진 찍기에도 좋게 전복 한 마리를 모양대로 썰어 올리기도 하고, 고급스럽게 소라나 해삼을 쓰기도 하는 모양입니다만 주재료로 가장 흔한 것은 역시 한치나 자리입니다. 공통적으로 여름철에 제주도에서 많이 잡히지요.
다른 오징어류에 비해 살이 여리고 단맛이 나는 한치는 대체로 다들 좋아하는 식재료입니다. 자리는 자리돔이라고도 합니다. 크기는 애기 손바닥만 하지만 색이 검고 뼈가 억세서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뼈째로 석석 썰어 넣은 자리물회는 먹는 데 난이도가 있습니다만 좋아하는 분들은 생선가시가 입안을 찌르는 느낌도 즐기며 드십니다.
물회를 만드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재료를 손질해두고, 오이며 양파, 미나리, 부추, 고추 등의 채소를 채 썰어서 더합니다. (자리물회의 경우엔 제피(초피나무 잎)를 꼭 넣어야 한답니다) 이것을 된장과 식초로 버무려두었다가 냉수를 부으면 완성입니다. 옛날 제주도 어른들 표현으로 물회에 숟가락을 꽂았을 때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건더기가 풍성하게 대접에 담아내면 됩니다.
여기서 고추장이 아닌 된장을 사용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제주도에선 왜 된장을 사용했을까요. 제주향토음식명인 1호 김지순 선생님에 따르면 “뻘건 것은 물 건너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1930년대 출생인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제주도는 본래 된장, 간장 문화로 고추장을 많이 쓰는 음식은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로 유입된 피난민과 함께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이전에 고추장을 먹는 문화가 전혀 없었겠나 싶지만 제주도의 향토음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과연 빨간색이 도드라지는 음식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지순 선생님의 말을 계속 옮겨보자면 고추는 육지보다 일조량이 많아 빨리 자라는 통에 빨갛게 익기도 전에 벌레가 끓기 마련이어서 제주도 사람들은 풋고추를 즐겨 먹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약이 보편화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고추장이 귀했던 데에는 제주도 토질의 척박함도 거들었을 거라 추측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선 논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화산암 토질이 물을 가둬두는 농사법에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제주도에는 쌀이 굉장히,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붉은 고추와 쌀이 귀하니 고추장도 역시 귀했겠지요. 다행한 것은 콩은 어디서든 잘 자라는 작물이고, 제주도 특산인 푸른콩(푸른독세기콩)으로 담근 된장은 맛에서 경쟁력이 있었다니까요.
된장과 함께 제주도식 물회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바로 식초입니다. 보통 우리가 물회를 먹을 때면 달콤한 육수를 기대하게 되지요.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기 위해 무슨무슨 과일을 갈아넣는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제주도식 물회에는 그런 단맛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신맛이 꽉 들어차있거든요.
제주도식 물회에서 신맛을 얘기할 때 재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유명하고 오래 장사한 물회 전문점을 가보면 테이블 위에 낯선 조미료 병이 있습니다. 바로 빙초산 병이 통째로 올라와 있곤 합니다. 오래전부터 물회를 먹어온 어른들이 대접을 받아들고는 숟가락에 신중하게 빙초산 몇 방울을 떨어트려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맛이 난다면서요.
화학약품 같은 빙초산을 왜 쓰느냐고 물으면, 제주도 사람들은 그냥 예전부터 써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확실히 빙초산은 몸에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순도 99퍼센트의 아세트산으로 그냥 신맛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향토음식보존연구원의 양용진 부원장은 제주도의 물회에는 원래 쉰다리식초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쉰다리식초는 쉬어버린 보리밥으로 만든 식초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의 주식이었던 보리밥이 쉬어버리면, 그것을 누룩으로 발효시켜서 쉰다리라는 유산균 음료를 만들고, 그 쉰다리로 톡 쏘는 맛이 독특한 식초를 만듭니다. 6-70년대에 생활양식이 변화되면서 전통식초의 사용이 줄어들고, 당시에 중국집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했던 빙초산이 가정으로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고급스럽게는 전복이나 소라, 흔하게는 자리나 한치처럼 제주도에서 나는 횟감을 된장에 버무리고 식초로 간한 것이 제주도식 물회의 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회라는 것은 언제부터 먹었던 음식일까요?
사실 이 음식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어슷비슷합니다만, 어부들이 배에서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먹던 음식이 육칠십 년 대에 포구 횟집의 별미가 되고, 팔구십 년 대의 외식과 바캉스 바람에 힘입어 관광지 음식으로 발달된 경우입니다.
제주도 토박이 어른들에게 여쭤봐도 비슷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집에서 먹던 음식이었다, 다만 물회라고는 하지 않고 냉국이라고 불렀다, 라고요. 냉국과 물회가 뭐가 다른가 보면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냉국, 내용물을 풍성하게 해서 식당에서 팔면 물회인 것입니다.
제주도지편찬위원회에서 출간한 <제주여성문화>라는 책자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반찬은 없어도 국은 꼭 있어야 하는 식사 문화였다고요. (한국 사람의 국에 대한 집착이 먼저 떠오르지만, 주식인 보리밥과 좁쌀밥처럼 목이 메는 음식에 국은 필수였다는 설명에 납득을 합니다) 그리고 냉국은 국이면서 된장으로 만든 음료수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옛날, 한 제주도 여성이 한 여름에 밭에 나가 일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외(오이)를 된장에 버무려 찬합에 넣어 밭에 가져갑니다. 끼니때가 되면 찬합에 물을 붓고 식은 보리밥을 말아 먹습니다. 짭짤한 된장 국물은 염분을 보충하고, 식초의 신맛은 더위에 지친 입맛을 잡습니다. 음식물이 상하는 것도 막아주고요. 합리적입니다.
올해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정말 더웠어요. 더워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부엌을 기웃거려보지만 너무 뜨겁습니다. 해가 져도 달궈진 건물의 벽과 천장에서는 계속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속에서 불을 써서 요리를 할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밥을 사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슬슬 지겹기도 하고, 뭔가 만들어먹기는 해야 하는데…… 할 때, 냉국이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이 그리워질 나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냉국 한 그릇을 만들어 먹고 기운을 차려, 이에 대해 끄적끄적 글을 써보았습니다.
Written by 큰고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