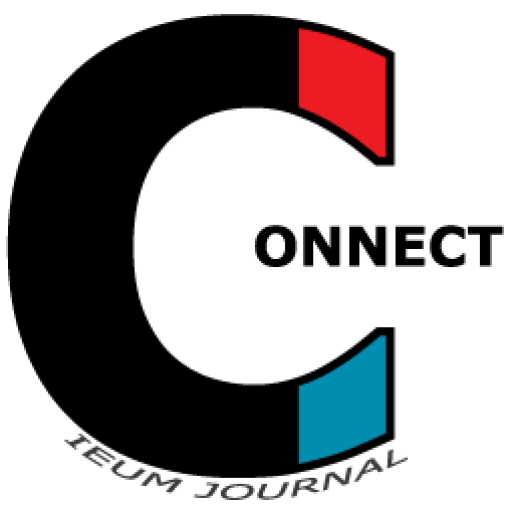도쿄에서 홍차 마시러 다니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1년 동안 올렸더니 홍차에 대해 써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입맛을 들여 신나게 맛있게 마시러 다녔을 뿐 홍차 지식을 착실히 쌓지 않아서 다양하고 신기한 홍차의 세계를 소개할 깜냥은 없고, 음식을 주제로 했던 과거의 몇몇 저널 기사 명문들마냥 인문학적 깊이가 있는 생각도 풀어 놓을 만한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홍차 마시면서 떠올렸던 아무 이야기나 그러모아 봅니다.
홍차만이 가진 녹차류와는 다른 매력은 무언가를 섞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우려낸 그대로 마시는 것도 좋지만, 기호에 맞는 것이면 무엇이든 넣어도 좋습니다. 기본은 설탕, 레몬, 우유입니다. 설탕을 넣으면 혀에 부드럽게 감기는 맛이 생기고, 레몬을 띄우면 산뜻해지지요. 우유를 넣으면 또 전혀 다른 느낌의 고소한 음료가 됩니다. 그 외에도 문외한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걸 넣어도 되나 싶은 부재료들이 많더군요. 러시아와 서아시아에서는 잼을 넣는다고하지요. 버터나 연유를 넣는 문화권도 있습니다. 베리류 과일이나 허브, 스파이스를 넣는 경우는 흔합니다. 스파이스가 들어가는 인도식 밀크티인 짜이도 많이들 드시지요. 부재료와 배합하여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 가향 홍차도 이전에 막연히 알던 것보다 종류가 훨씬 많더라고요. 개중에는 고추나 후추를 넣어 매운 맛을 내는 홍차가 있어 신기했습니다. 맛을 깊고 진하게 만드는 것과 가볍고 산뜻하게 만드는 것, 또는 강한 부재료를 넣어 아예 맛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 등 여러가지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이 홍차의 핵심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섞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설령 홍차 맛이 마음에 안 들게 나왔더라도 살려낼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너무 오래 뜨겁게 우려서 진해진 홍차는 그냥 마시기엔 떫고 부담스럽지만 우유와 설탕을 넣고 밀크티로 만들기에는 오히려 좋기도 합니다. 섬세하게 우린 홍차는 우유를 넣으면 물에 우유를 탄 것처럼 싱겁지만, 오래 우려 맛과 향이 진해진 홍차는 우유 맛에 지지 않고 대등하게 향과 맛을 지키니 밀크티 재료로 어울립니다. 또 중동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끓여 아주 진하게 우린 홍차에 설탕을 잔뜩 넣고 마시는 것이 표준적인 음용법이라고 하지요. 실패한 홍차는 없다!는 교훈을 준다고 할까요. 그렇기는 해도 역시 낙엽 달여 마시는 것처럼 떫은 느낌이 싫어서 홍차를 기피하는 분이 계시다면 떫은 맛이 거의 없는 인도 닐기리(Nilgiri) 지역의 홍차부터 드셔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홍차의 또 하나의 매력은 이것 저것 곁들여 먹는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찻잎이 세계 여러 곳에서 생산되고 세계 여러 곳의 사람들이 지금도 홍차를 마시고 있으니, 홍차와 함께 먹는 음식도 다채로운가 봅니다. 아무래도 영국의 티 타임 문화가 가장 대중적이다 보니 스콘과 쿠키와 샌드위치가 정형화된 곁들임 음식으로 여겨집니다만 다른 문화권도 나름의 고유 식문화와 차를 조화시켜왔고 은근히 다 잘 어울려요. 한 인도계 홍차점에서 약밥을 달달하게 만든 것 같은 간식인 할루와(haloua)와 다질링을 마신 적이 있는데 무척 잘 어울린다고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퍼스트 플러시first flush라고 하는) 봄에 수확한 차잎은 녹차와도 비슷한 맛이 나니 녹차에 곁들이는 과자나 떡류와 매치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막연히 녹차 문화권이라고 생각되는 한중일도 모두 옛날부터 홍차를 마셔 온 전통이 있고 현지의 전통적인 티푸드와 합을 맞추어 왔답니다. 그러니 중국과자나 화과자를 곁들인 홍차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권에서 각각 나름의 홍차 문화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 점에서 홍차 가게마다 사장님이 영향 받은 문화의 흔적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영국식 티 타임 기분을 한껏 낼 수 있도록 인테리어 소품부터 가구까지 영국에서 공수하는 티룸에서는 삼단 트레이에 티 푸드를 얹고 손님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사장님이 차잎 원산지인 인도나 스리랑카 문화에 빠져 미술품이나 커리 스파이스를 같이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백발의 나이 지긋한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낡은 일본식 끽다점도 있지요. 미국 남부식(미국에선 홍차가 주로 남부에서 소비된다고 하죠) 펍을 운영하면서 술에 곁들여 홍차를 취급하는 와일드한 느낌의 가게도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운영방식을 보면 이곳 주인장은 어쩌다 홍차에 빠져 이렇게 홍차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까 이런저런 짐작을 해 볼 수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먼 과거에 커피가 그러했듯이, 가까운 과거에 와인이 그러했듯이 외래 문물은 다 비싸고 고급스럽고 힘들게 격식을 차려야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롯데 실론티’와 ‘립톤 아이스티’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다기를 갖춘 공간에서 마시는 차라는 건 뭔가 국민 음료가 된 커피나 접근이 쉬운 대용차에 비해 저에게는 좀 심리적 벽이 있는 음료였는데요. 그런 벽이 동경이나 고양감이나 도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승화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이제까지 몰랐던 세계가 열리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벽을 쳐 두었던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마법으로 바뀌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림출처: qz.com)
사족으로 언어 이야기: 영어 ‘티(tea)’는 차(茶)의 중국 복건 민남 발음 테(tê)에서 온 것입니다. 같은 음료가 중국 북방과 광동 발음으로는 ‘차’, 남동 지역 발음으로는 ‘테’인 것이죠. 차는 중국에서 처음 마시기 시작해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육로로 중국과 교류한 문명은 주로 ‘차’ 방언권과의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이 음료를 ‘차’와 비슷한 이름으로, 해로로 중국과 교류한 문명은 주로 ‘테’ 방언권과의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이 음료를 ‘테’와 비슷한 이름으로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 음료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를 보면 과거 이 지역이 육로와 해로 중 어떤 경로로 중국과 교류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하지요.
Written by 이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