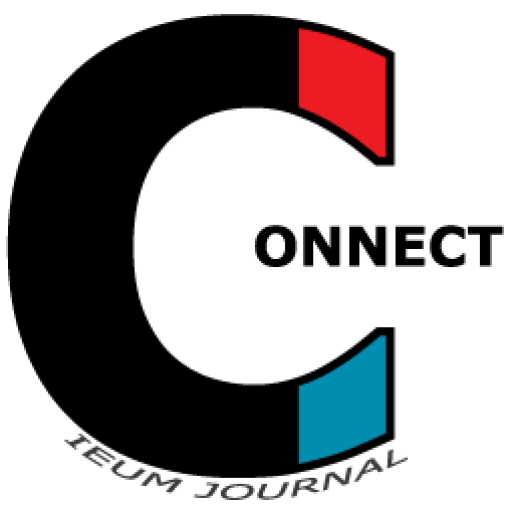런던에 다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가서 다음 해에 귀국했으니, 시간으로 따지면 약 40일 정도입니다. 난생 처음 가본 유럽이 영국인데, 영국은 유럽과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군데 가본 친구는 영국은 영국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다른 곳을 갔다고 할 수 없으니, 이왕 제가 느낀점을 위주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 달 남짓 다녀와서 영국에서 살아본 이야기라고 하니 좀 쑥스럽긴 하지만 말입니다.
런던의 첫 인상은 별로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흐리고, 비가 분무기처럼 왔습니다. 알고보니 겨울에는 일조량이 약 세 시간이 채 안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북반구 위편에 위치하다보니, 한국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세계지리 시간에 배운 ‘온난습윤’이라는 말을 알았습니다. 해는 짧은데 춥지는 않고, 비가 매우 많이 내렸습니다.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영국 남성들이 왜 장우산을 많이 들고다니는 지 알았습니다. 여기는 생활 필수품이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들고다니지 않았습니다. 비를 피할 수 없었으니까요. 히드로 공항의 출국장을 나오자마자 찝찝한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다섯 달 만에 만나는 연인은 매우 반가웠지만, 날씨만큼은 반갑지 않았습니다. 왜 영국사람들이 날씨이야기로 세 시간씩 이야기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그럴만 했습니다. 오늘의 해는 얼마나 뜰 것인지, 하루 중 내가 얼마나 햇빛을 쬘 수 있는 것인지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날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영국의 겨울 일조량은 정말 짧았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배웠는데, 현실은 해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루의 스케줄은 너무나 촉박했습니다. 일어나도 해가 떠있지 않았고, 해가 오후 4시면 완전히 없어져버립니다. 게다가 하늘은 지우개를 뭉쳐놓은 회색빛이었습니다. 밤잠도 많고 낮잠도 자는 저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는 하늘은 굉장히 파랗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해가 뜨면 영국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쓰고 다닙니다. 왠만한 햇빛에 꿈적도 않는 저에게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지만, 약 일주일만에 깨달았습니다. 햇빛이 워낙 귀한 곳이어서 직사광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짧은 탓인지, 식재료를 사기 위해 마트에 가면 여러 영양제를 쌓아놓고 팝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은 비타민 D였습니다. 비타민 D 영양제 옆에는 눈, 비염 관련 영양제가 6단짜리 진열대에 가득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항상 동나있습니다. 처음엔 건강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혼자 궁시렁 거리다가, 어느새 저도 그 약들을 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영국의 영양제 시장(!)은 굉장한 규모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타민을 살려고 먹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영양제 과다섭취를 우려하는 보도가 나올 지경이니,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식물은 해가 짧으면 오히려 쉰다고 합니다. 식물이 살기 위해 산소를 내뱉고, 질소를 머금습니다. 식물에게 생산활동은 광합성인데 이를 하려면 햇빛이 필요합니다. 여기 식물들은 거대한 비닐하우스 또는 요즘 유행하는 ‘테라리움’ 같은 환경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온난 습윤한 날씨 속에서 땅 속의 튤립과 수선화류의 구근은 굵어지고, 장미나무나 라일락은 철모르게 꽃을 피웁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한 일은 철모르게 핀 꽃들을 촬영한 것입니다. ‘겨울에 꽃 구경하기’가 제일 쉬웠을 정도니까요. 푹 쉰 식물들은 봄이 오면 매우 크게 꽃을 피웁니다. 부드러운 흙과 습기, 약간의 햇빛 정도만 있으면 될테니 그것대로 식물에게는 좋은 일이지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영국은 조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심기만 해도 나름 풍작(!)이니 말이죠. 영국왕실은 런던 곳곳에 ‘Park Royal’을 설치했습니다. 과거 중세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궁전이었던 곳이거나, 동물원, 템즈강의 일부를 공원화 시킨 것이죠. (참고로 템즈강의 백조는 ‘국왕’ 소유입니다) 토지세가 비싸기로 유명한 런던에 이리 넓은 정원이라니. 덕분에 건물이 빽빽한 곳에 있다가 숨통을 트이기는 좋았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영국의 지하철인 “underground”의 건물이 기본 18세기인 것도 많으니, 파크 로얄 안에 있는 건물들도 그 시절의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장미사랑은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날씨로 인한 우울한 분위기를 바꾸려는 필사적인 노력인지, 아니면 하나에 집중하면 끝장을 보는 것이 기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류별로 온갖 장미가 자랍니다. 사실 이들은 인도와 영국의 식민지에서 다 옮겨심은 이야기를 듣고 역시 영국이 ‘제국짓’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큰 온실 속에 각 대륙별로 식물을 분류하고, 그것을 영국이라는 국가가 건물을 지어 이것들을 ‘보호’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곳에서 여유롭게 테이블을 놓고 간단한 식사를 하는 시민들,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것은 꽃다발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날씨로 인해 비타민 D가 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이해가 갔습니다. 잠깐의 꽃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면,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사소한 말 한마디로 감정의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말도 안통하는 나라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영국에서도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대마초 냄새가 소똥 같다는 이야기를 얼핏 주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왜 풀에서 소똥 냄새가 날 수 있느냐’하고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길에서 대마초를 피웁니다(!). 맙소사. 정말 소똥냄새가 났습니다. 왜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나 생각해보니, 초식동물인 소가 풀을 먹고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부산물이 그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풀을 말려서 비비고 태우니, 특유의 냄새에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습기가 가득찬 공기, 거센 바람, 이런 것들이 합쳐져 런던에 대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여지껏 늘어놓은 이 말들이 다 런던의 날씨 이야기입니다. 차를 마신다면서 3단으로 된 트레이에 샌드위치와 스콘을 올려 식사를 하고, 건강이나 낭만을 위해서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닌, 대중교통비가 비싸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보단 생존이 중요했던 사람들의 도시는 더더욱 복잡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계급질서가 살아있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로 만든 건물들이 남아있을 수 없고, 벽돌집 안에 인테리어로 설치한 목재들도 금방 삐걱거립니다.
다음엔 영국의 물과 홍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을 먹는 것이 저에겐 제일 힘든 일이었거든요. 런던에는 꽃이 모두 피었다고 합니다. 저도 꽃피는 다음 달에 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Written by 이민기
일월에 핀 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