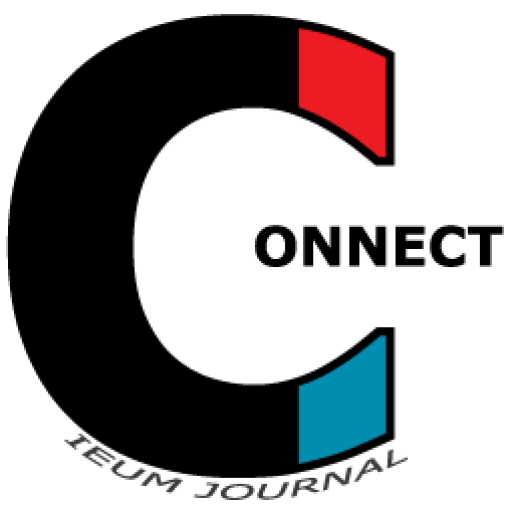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엄마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해. 나 그렇게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군대에서 괴롭힘당하고 내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해도 엄마는 그냥 알았다고만 했지, 나 제대로 이해해 준 적 없잖아. 엄마도 우울증 앓았으니까 알잖아, 이거 열심히 힘낸다고 낫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엄마, 나한테 너같이 머리 좋은 애가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제대로 된 회사 안 다니고 그렇게 있느냐고 생각하지 마.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나한테 어떤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 제발.”
2018년 3월이었나 4월이었나, 분명 날씨는 추웠던 걸로 기억한다. 지하철 타는 게 숨 막혀서 돌아가더라도 버스를 즐겨 탔던 나는 처음으로 살면서 엄마의 가슴을 벅벅 찢어 놓고 전화를 끊었다. 저 말을, 버스에서, 적어도 저 때 하지는 말았어야 했나 생각이 들다가도 아마 저 때 얘기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얘기하지 못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적어도 초등학교 때 우리 가족은 없이 살았지만 나름의 행복이 있었다. 뒷문이 없어서 앞좌석을 앞으로 당겨야 뒷좌석에 탈 수 있었던 빨간색 프라이드를 타고 집 근처 산에 가서 고사리도 따고 저수지에 가서 물멍도 때리고 대흥사에 놀러 가서 집에서 타온 마차를 보온병에서 꺼내서 호호 불어가며 먹기도 하고.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엄마는 우리 가정교육을 그렇게 빡세게 시켰고 나는 똑똑하고 싫은 소리 잘 안 하는, 애늙은이 같은 장남으로 커 나갔다.
초등학교 때 굳이 차로 30분을 나가서 몇 달 동안 다녔던 옆 도시 영어학원에서 웅변대회를 해서 상을 타왔을 때, 학교에서 IQ 검사를 했는데 139가 나온 것을 엄마에게 말했을 때 엄마는 정말 크게 기뻐했다.
애비가 생활비를 제 때 보내지 않자, 엄마가 옆 도시의 건축사무소 경리 일을 하면서도, 그러다가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놓고 동네 갈비집 뒤에서 동네 이모 삼촌들과 날마다 화투만 칠 때도 동생과 나는 엄마가 우리에게 빼곡하게 사랑을 퍼준다고 생각했다. 그땐 그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가 더 외로울 것 같았기에 그 믿음을 놓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애는 서울에서 키워야 한다며 밑 지방에서 잘살고 있는 나와 동생을 강제로 서울에 끌고 온 애비는 돈을 버는 것 이외의 모든 부친의 의무를 포기한 것 같았다.
밥을 차려놓고 우리가 편식한다고 밥상을 엎어서 동생이 냄비에 머리를 맞기도 하고 집안에 음식을 방치해 놓아서 개미가 시리얼에 우글우글 끌었는데 그걸 골라내서 먹었던 적도 많았다. 우유에 개미가 동동 떠다녔다. 아직도 나는 집개미만 보면 치가 떨린다.
주말만 되면 경마장에 가던 애비는 2002년 월드컵 4강전을 경마공원에서 같이 보게 했다. 그날 슬펐던 게 경기에서 져서였는지 아니면 애비가 우리에게 숨김없이 바지를 벗은 것이 역겨워서였는지는 아직도 헷갈린다.
중-고등학교 모두 왕따에 시달렸다. 애비는 그 따돌림의 원인을 나에게 돌렸다.
‘븅신같이 니가 맞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너도 때려 이 새끼야!
니가 뭐가 모자라서 쳐맞고 다녀 기집년같이.
니가 그러니까 좆밥으로 보고 널 더 괴롭히는 거야. 알아?’
더 이상 애비에게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지금의 나는 ‘학교폭력 생존자’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됐다.
애매하게 가난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는지 나는 학교에서, 정부에서 주는 여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급식도 공짜, 학교 수업료도 공짜, 수학여행비도 공짜. 물론 그것을 무료로 누리기까지 나는 나의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 오만 서류를 떼야 했고 그것을 제출한 사실은 학교에 비밀로 부쳐지지 않았다. 나는 나의 동급생들에게 나의 가난을 전시 당했다.
그 뒤로 돈이 없어 스펙을 쌓지 못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다가 호모포비아 사장 밑에서 2년 동안 방역 일도 하고 발길 닿는 대로 일하다가 운 좋게 짝꿍을 만나 계획적으로 일이란 걸 하고 경제생활을 하면서 빚을 갚고 다시 지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20년 전 개미가 동동 떠다니든 시리얼을 먹든 나는 지금 20평 아파트에서 짝꿍과 삼계탕을 먹는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남은 나는 돈에 미친 사람이 됐다. 사지도 못할 6천 만원짜리 차를 매일 구경하고, 뭔가를 살 때 주위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짜린데~’ 하면서 자랑하는, 얼마 없는 돈으로도 돈 쓴 걸 티 내지 못해서 안달 난 돈미새가 됐다.
짝꿍과 ‘변절한 친구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도 여태까지 정신 차리고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짝꿍은 “너 얼마 전에도 이거 얼마짜린데 하면서 돈 자랑해 놓고 무슨.” 하면서 날 비웃었다.
내가 애써 외면했지만 사실 나에게 남아 있는 가장 큰 외상은 ‘나는 늘 가난해’ 였는지도 모르겠다. 어릴 땐 가난이 모부 탓이라며 모부를 원망하고 비청소년이 됐을 땐 돈을 못 버는 나 자신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안다.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도 잘 해낸 것이라는 걸.
나와 짝꿍은 우리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꼭 ‘젠더론’을 만들어서 돈이 없어서 성별정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약속을 했다. 아직도 돈에 대한 나의 욕망은 매우 크지만, 우리가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만 돈을 벌려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번 돈으로 주변의 동료들을 돕고 우리가 하는 일로 주변의 동료, 친구들을 돕고자 우리는 오늘을 산다.
지금 내가 하는 두 가지 일을 직업으로 고른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내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위치가 되면 그때는 나에게 기댄 동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당신이 가난한 건, 당신이 외로운 건, 당신이 아픈 건 당신의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난하고 외롭게, 아픈 채 이 세상을 건너봐요. 부족하지만 내가 함께 할게요.’
가난에 파묻혔던 중학생 때 내가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죽지 않고 살아 이 자리에 온 건 어쩌면 그렇게 살아 사회를 재해석하고 내 곁을 내주라는 신령님의 안배였는지도 모른다. 이 삶의 모든 여정이 신령님의 계획이라면 기꺼이 살아 내겠다. 기꺼이 살아서 동료들에게 햇볕 같은 사람이 되리라. 내가 손해보고 아프고 우는 순간이 있더라도 동료들에게 곁을 내주며 살리라. 한껏 주고 되돌려 받길 기대하지 않는 그런 동료가 되리라.
Written by 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