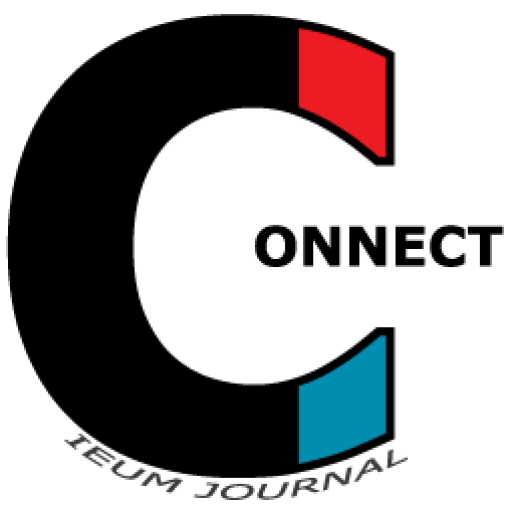I. 여름과 가을 사이
아침에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을 향할 때면 바람이 제법 서늘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 내내, 하루 해가 저물어도 가시지 않았던 더위처럼 이 여름이 언제 지나가는지, 끝나긴 하는지 의심이 들곤 했다. 가물기는 또 왜 그렇게 가물었는지 느닷없이 내린 비에 더위도 한풀 꺾인 요즘, 드디어 아침 저녁으로 가을 향기가 느껴진다. 느릿느릿 제자리를 맴도는 듯 하던 시간은 차곡차곡 흐르고 있다. 8월 끝자락에 걸린 달력을 넘기며 문득 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가을, 지나면 겨울. 올해도 이렇게 저물어 간다.
연말연시의 흥겨움도 예전만 못해서인지 지인들과 주고받는 새해 인사도 카톡으로 대신하고, 재미있는 스티커에 깔깔 대며 웃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 또 일 년의 끝이 흐릿하게 보인다. 계절이 참 재미있는 것이 한 겨울을 발 동동 굴리며 보내고 나면 다시 봄이 찾아온다. 우리는 그래서 한 해를 미처 보내기 전에 새해를 맞고 또 맞는지 모르겠다. 끝과 함께 오는 시작, 시간은 나의 지각과 무관하게 참 부지런하다.
II. 증명사진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을 찾았다. 매 학기 계약서를 쓸 때마다 사진을 요구받는다. 6개월 이내의 사진을 내라는데, 매 번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속내를 들여 보면 예전 사진이나 지금 찍는 사진이나 별 차이 있으랴는 애매한 자신감도 있었다. 그렇게 버틴 것이 벌써 십 년. 이제는 매 번 내던 사진을 그대로 쓰기엔 어딘 가 마음 한 구석이 찝찝하다. 그래서 찾은 것이 사진관이 아닌 스튜디오였다. 예전엔 단정하게 옷깃만 여며주던 사진사 아저씨가 이제 작가가 되어 포토샵도 알아서 척척 해준다. 그리고 인쇄 전에 마지막으로 와서 확인하라며 나에게 던진 한마디가 다음과 같다.
“ 본인 얼굴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사진작가 말로는 별로 고친 것도 없다는데 보정의 효과가 너무 좋은 탓일까? 얼른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초조해 하는 작가의 눈치를 보면서도 긍정의 끄덕임 대신 자꾸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비대칭한 턱선도 예쁘게 잡아주고, 눈매의 잔주름도 정리해주고, 피부 결도 곱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왠지 화면 속 여인네는 나와 닮았지만 나는 아닌 누군가 같다. 사진을 받아들고 나와서 한참을 지긋이 들여 보다 묘한 이질감의 정체를 깨달았다.
포토샵으로도 감출 수 없는 세월이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III. 발달
아기가 뒤집기를 처음 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감동스러웠던 그 첫 순간 이후 매일 밤 아기가 제 몸을 뒤집을 때마다 혹시 숨이 막힐까 화들짝 깨곤 했다. 그런데 내 아이는 어느새 더듬더듬 말을 하고, 두 발로 온갖 곳을 헤집고 다닌다. 엄마가 주는 이유식을 제비 새끼마냥 받아먹던 아가는 이제 두유면 두유, 빵이면 빵 척척 제 엄마에게 요구 한다.
갓난쟁이 시절과 여전히 같은 것은 머리 감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것. 그래도 머리에 보글보글 거품을 얹고 거울을 보게 해주면 까르르 웃는 것이 어느새 아기는 스스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평소와 다른 모습에 재미를 느낄 만큼 자라났다. 쉼 없이 아기의 성장을 온 몸으로 겪으면서, 화장실 거울 앞에서 뽀얀 아기 얼굴 옆에 비친 내 모습을 흘끔흘끔 보곤 한다. 그 때마다 굳이 의식에 떠올리진 않았지만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다.
아, 이 여인은 이제 젊은이가 아니구나.
다만 모른 척 눈 감았을 뿐. 거울 속 얼굴은 과장된 표정과 조명으로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감춰 주지만 정직하게 마주보는 사진 속 얼굴은 나에게 익숙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모두 보여준다. 작가의 말처럼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무언가 미묘하게 내 기억과 다른 것은 아마도 머릿속에 나는 여전히 젊은데 실상 내 얼굴은 이제 그 흔적만 남은 탓이다. 아무리 봐도 어른인 나. 마음 한 구석에 아직도 스물 남짓 인 냥 까불까불하던 아이가 불편해진 것이다. 이 불편한 진실은 사진을 통해 저를 증명했다. 씁쓸한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다가 이내 번진다. 지금의 내 얼굴을 다시 한 번 지긋이 바라본다.
안녕, 너는 늘 그대로인줄 알았어.
IV. 계절은 나선형으로 돈다
여름 끝자락에서 우리는 가을을 반갑게 기다린다. 한 편으로는 이제 반년도 채 안 남은 일 년을 생각하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아이고. 올해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반이나 했나 모르겠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또 아이의 방긋 웃음을 보며 무거움을 떨쳐 낸다. 매 순간 자라는 아이처럼 오늘의 나는 어제와 다른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다른 내일을 맞이한다. 시간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 단지 그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자꾸 제 위치를 잊는 바보가 여기 있을 뿐이다.
올해 아기와 함께 손잡고 걸었던 꽃길이 떠오른다. 제 아빠와 잡기 놀이를 하며 서툴게 걸음마를 떼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웃음을 주체 못하고 잔뜩 신이 나서 엄마에게 팔 벌리며 오던 그 장면은 힘이 들 때마다 슬쩍 꺼내 보는 마음 속 사진이다.
아, 다가올 겨울 아기와 함께 맞을 눈송이가 벌써 기대된다. 차가움에 화들짝 놀라다가 사르르 녹는 모습에 눈을 동그랗게 뜰 표정을 상상해본다. 그 맘 때면 아이는 좀 더 자랐겠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을 나에게 보여주겠지.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꽃을 맞아 걸으리라. 오래 오래 걸으며 향을 맡게 해줘야지.
그렇지만 내년 봄이 와도 그것은 내년 봄일 뿐 올해 아기와 같이 보았던 봄꽃은 이미 떨어졌다. 굳게 붙잡고 있었던 내 젊음도 늦은 인사를 기다리고 있다.
안녕. 안녕.
꽃이 저문 그 자리에 열매가 자라듯이 내 아이도 어미의 젊음을 먹고 자라겠지.
웃으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