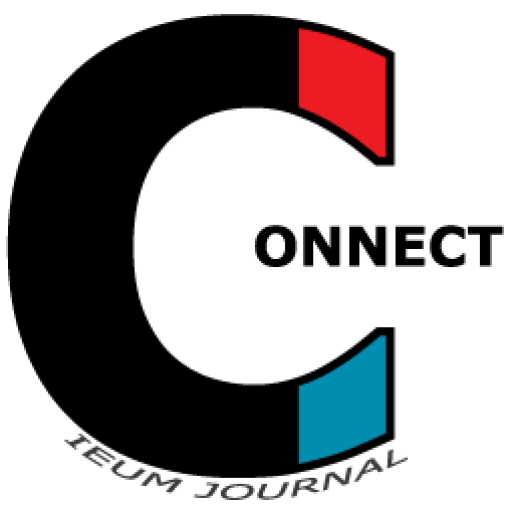Ⅰ. 전두환의 귀환
몇 년 전 광주에 볼일이 있어 갔을 때 구 전남도청을 지키던 한 시민이 설명한 518 이후의 광주는 믿기 어려웠다. “매년 5월 광주거리에서는 사람보기 어렵고 향냄새만 맡을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길까 곡소리는 집밖으로 내기 두려웠다.” 이 말을 들으니 80년의 5월은 얼마나 참혹했는지 또 그 이후는 얼마나 소름끼쳤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들어졌다.
얼마 전 전두환 측은 518재단에 전화를 했다 한다. 그리고 사과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문의 했다고 한다. 회고록을 쓰는 과정에서 진정 반성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떠 본건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본의가 어떻든 518을 기억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다.
슬퍼하는 말 한마디도 눈치봐가며 했던 시민들에게 ‘받아주면 사과하겠다’는 오만함은 아직 건재한 그의 힘을 보여준다. 그의 힘은 단지 개인의 특성이 아니다. 국가폭력과 자본을 강화했던 80년 이후의 약육강식이라는 이 땅의 방향성이다. 그는 그 방향성의 상징적이고 현실적인 힘이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전두환을 욕하고 비판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힘이 사라지진 않는다. 오히려 그의 세력이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는 현실은 사람들의 자유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 아직도 한국은 518을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권력은 지난 2년간 온 힘을 다해 진실을 덮으려고 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으려 한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배를 인양하지 않으려는지, 왜 모든 책임자를 찾지 않는지, 왜 사후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지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 되레 가족들을 피해자 팔아 돈을 탐하는 파렴치로 몰고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치부했다.전두환이 힘을 유지하게 하는 현실은 또 하나의 거대한 참극을 빚어냈다. 2014년 4월 16일 국가의 대규모 학살이다. 518이 작위적 학살이었다면 416은 부작위 학살이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즉 코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손쓰지 않았다. 언론이 생중계하는 그 시각에도 책임자들은 책임져야 할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416참사 후 2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이 죽었는지 조차 모른다.
이제 한국사회의 국가는 더 이상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는다. 그저 죽게 한다. 희생자들을 죽도록 내버리고 피해자와 가족, 이웃을 죽어가게 한다. 또 국가는 직접 곡소리가 집밖을 새어나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 이웃의 삶에 걸림돌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입을 열기 힘들게 한다. 국가권력은 이제 억지로 무얼 하지 않고 그저 말 한마디만 뱉어도 될 만큼 일상과 의식 깊숙이 이웃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심었다. 전두환은 그런식으로 박근혜가 되어 돌아왔다.
Ⅱ. 내 다친 손은 당신의 손을 놓지 않는다
언젠가 안산 분향소에서 가슴이 턱 막히는 말을 들었다. 분향소 옆에 있던 적십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일이다. 아는 사람이 없어 혼자 밥을 먹는 내 곁에 한 무리의 피해자 가족들이 와서 앉아 밥을 먹었다. 당시에는 이준석 선장의 1심 판결이 나기 며칠 전이었는데 가족들의 대화에는 분이 가득했다. 그러다 한 분이 “살인 인정받고 사형을 받을까? 사형을 받는게 당연한데 그렇게 될까?” 라고 물었다. 그때 질문 받은 아버님 한분이 대답했다. “우리가 사람생명 살리자고 하는데 사형을 바래서 되겠어? 살인 인정하고 형을 받으면 된거지. 그거라도 되면 좋겠다.”
416참사와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을 부르는 이름이 많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이름을 정했다. 416가족협의회는 당시의 사건을 ‘416 세월호 참사(이하 416참사)’라고 이야기 하며 희생자, 미수습자와 생존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 피해자 가족(이하 416가족)이라고 부른다. 누군가 416참사를 ‘사고’라던가 피해자 가족을 ‘유가족’이라고 하면 가족들은 바로바로 정정해준다.이 말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뒤집어 놓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당연히 항상 울분에 차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성적인 판단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 그동안 얼마나 오만함에 가득 차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416가족들은 이름 뿐 아니라 행위를 담은 기록도 소중히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참혹한 경험을 통해 뼈에 새긴 터일 수 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매몰차게 인정 없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기엔 아주 열정적이다. 부족 할 땐 주변에 손을 내밀고 함께 하자고 보채기까지 한다.
518 이후 시민사회 각계의 노력은 87년 6월 항쟁과 7,8,9월 노동대투쟁으로 결실을 맺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다시금 회복되고 전 사회적으로 민주적인 의식이 발전 할 토양을 갖춰 갔다. 416참사 이후엔 아직 무언가 큰 계기를 만들어내고 큰 변화를 보이는 행동이 뚜렷하게 결과로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416가족들의 활동은 큰 계기보다 더 의미 있다. 국가권력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억압을 하고 그에 동조하는 시민들에 둘러싸여도 스스로 입막지 않는다. 되려 이웃이 내민 연대의 손을 잡고 믿음을 약속하고 국가의 통치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슬플 때 크게 울고 기쁠 때 함께 웃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같은 생명을 지닌 인간으로서 참사를 경험한 경험자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주인 된 한사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한다.416가족들의 꿈은 모임의 명칭처럼 416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한 안전사회의 건설이다. 416가족들은 416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 518, 밀양, 쌍차, 강정, 가습기 청결제 피해자 등 한국사회의 아픔에 연대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아니다. 스스로와 다른 피해자들이 무언가 결여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가 주인임을 다시 확인하고 이웃과 호흡한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으려하고 실천하려 노력했다.
부수적 피해라는 말이 있다. 전쟁 시 작전 중 발생한 ‘의도치 않은’ 민간피해를 군사용어로 부수적 피해하고 한다. 국가권력이 반민주적 행태를 유지해도 권력이 집중되는 사회 방향성은 수많은 부수적 피해를 낳고 있다. 이는 적으로 규정하여 학살하는 방식만큼이나 위험하다. 국가와 자본의 이름으로 움직이면 몇 사람 죽는 것쯤이야 아무렇지 않은 사회가 된 것 같다.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 굵직한 혁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곁의 이웃과 현실을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 희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작더라도 함께하는 행동이다.
Written by 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