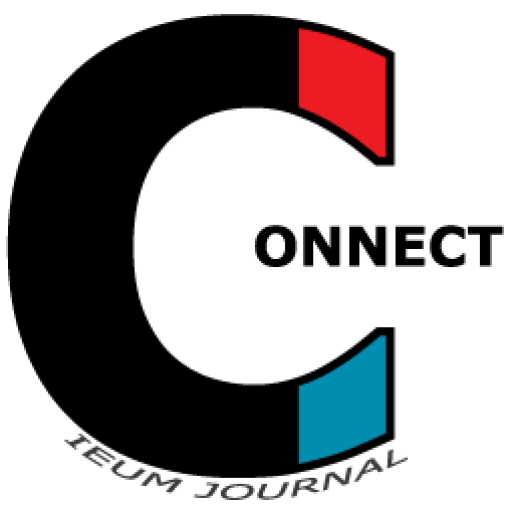쇼케이스 [늘리고 비틀리고 흔들린 뒤에는]은 확실히 불편하다. 불편하다는 감정은 바라보는 대상이 영역과 영역의 경계점에서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비롯된다. 경계선 밖에서 바라보는 것은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의미들로 가득 차 있다. 의미들은 말이 되어 현재를 사는 우리를 위태롭게 느끼게 한다. 우리는 나타난 말들과 그 아래 숨겨진 의미에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불편함과 경계선에 서서 무엇인가 바라본다는 태도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유용함이 있다. 익숙한 색감과 낯선 단어들. 쉬운 취향과 어려운 향기들. 낯익은 사물과 불편한 가치규정 사이에서 내면적으로 흔들리고 비틀리는 사이, 우리의 생각과 시선은 얼마나 흔들렸을까?
[늘리고 비틀리고 흔들린 뒤에는]은 세 개의 굵직한 퍼포먼스로 구성되었다. 언덕의 [우유 주는 브라괴물]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가지고 있지만 쓸모는 다른 젖꼭지와 쓸모의 이유이자 생산물인 우유, 그리고 그러한 우유 주는 행위를 기억하기 위한 행위로 확장된다. 그리고 수많은‘브라’들은 여성의 쓸모를 규정하면서도 감추고 조이기를 강요한다. 강요된 ‘우유 주기’와 그것들을 애도하는 곡소리로 대변되는 기억하기 위한 행위는 함께 우유를 먹고 마심으로써 여성의 생식적인 면만 강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존재는‘인간을 낳고 잘 기르기만 하면 된다는 존재’가 되어 그들만의 세상에서 다시금 하나의 굵직한 맥락으로 묶인다. 퍼포먼스 참여자는 젖꼭지로 열린 공간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눈빛들을 느끼며 수많은 브라 속에 중첩되어 자신의 자유를 상실한 어떤 존재가 따라주는 우유를 마시는 불편함을 기억한다.
곽혜은의 [이 세상엔 두 가지 색과 n가지 향기가 있다]는 두 가지 색으로 규정된 공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로 자신의 취향을 합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입체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항대립적인 설문지와 그들 사이에 펼쳐진 스펙트럼들의 합들은 자신이 어떤 단일한 것이 아닌, 다양한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빚어진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이렇게 상기된 점은 잘 짜인 두 가지 색으로 구성된 방을 나설 때 자기 자신을 주변에게 설명할 하나의 방법으로 작용한다. 퍼포먼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복잡한 향기를 초록․파랑․빨강․노랑의 네 가지 색으로 다시 규정짓게 하고, 그것을 빛 앞에서 한 개씩 중첩시킨다. 색들은 각자 복잡하고 다른 맥락을 가진 존재들의 합이며, 또 그것들은 합쳐져서 다양한 빛으로 산란된다. 단순하게 보였던 것들이 복잡해지고, 복잡한 것들이 다시금 단순해져서 다시 한 번 복잡하게 되는 맥락의 운동성의 담보는 자신이 향을 고르는 순간부터 퍼포먼스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재인식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들의 색들은 투명한 물에 의해 붙지만 그 투명한 물조차 회색으로 보이는 흰색의 빛 앞에서, 우리는 결국 어떤 것들로 보이고 규정지어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향료들을 뽑아내던 스포이트가 꽂힌 시약병들이 분홍과 파랑의 빛들 사이에서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은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
윤상은의 [늘어난 사랑]은 다양한 언어들로 규정된 오브제들 사이에 자신이 어떻게 규정되어지는지를 바라본 점이 섬세하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오브제들과 자신이 사랑했던 대상이 사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느낌들이었음을 밝혀낸다. 사랑스런 대상들조차 일정하게 꾸며진 공간 안에서 일정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런 이미지만 강조된 등신대와 자신은, 그리고 자신 또한 어떠한 이미지와 언어로 규정됨으로 인해 쓰러지고, 쓰러지며, 쓰러진다. 그리고 불편함을 느낀다. 익숙하지만 익숙하게 부여되지 않은 것들. 익숙하게 대했지만 결국은 익숙하게 될 수 없는 것들. 생명을 가진 것과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들의 가치를 논하는 담론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규정된 존재인가, 규정하는 존재인가? 반원형의 무대공간에서 우리의 시선은 또 한 번 규정함과 규정되어짐의 간극에서 늘려지고, 비틀려진다. 하지만 물체들은 숨을 쉬지 않는다. 숨을 쉬는 인간이 그렇지 않은 존재들을 숨 쉬게 만들었을 뿐이다. 각자 숨을 쉬고 있는 인간 또한 진실에서 물러나 뒤틀려지는 왜곡을 말하는 순간이었다.
김인선의 [산만한 미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글의 끝을 맺고자 한다. 기록은 기록하는 사람의 따뜻한 관찰을 기초로 한다. 회백색의 바탕 위에 작가가 그린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은 포근함을 담보로 한다. 기록은 이러한 점에서 주관적이며, 또한 객관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은 프리즘과 같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드러낸다. 반짝이는 은색으로 그려진 생각의 길을 걷다 보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깨트렸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움직임으로, 몸짓으로, 오브제로, 향기들로 다시 만들어냄으로써 얼마나 많은 젠더의 좌표들을 찍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기록들이 그러면서도 기록성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이유는 시간 순서대로 배치된 배열에 있다. 이 배열들에 나타난 역사성은 시간의 연속된 조각들에서 은근히 반짝거렸다. [늘리고 비틀리고 흔들린 뒤에는] 프로젝트의 쇼케이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작가들을 둘러싼 많은 논쟁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다르면서도 비슷했는지를 알 수 있다. 젠더는 어느 한 가지로 규정될 수 없다. 그것은 젠더를 가진 사람들을 어떤 한 가지 언어나 이미지로 규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불편함은 불안정성을 담보한다. 그리고 다시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나는 어떠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내가 정한 것인가? 이러한 시선에서 또 한 번 ‘어떤 것’으로 규정된 우리들은 그 의미를 일상으로 확장한다. 자신이 자신다울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불안정성과, 타인과의 시선의 불안정성에서 중심을 잡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런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기에 쇼케이스 [늘리고 비틀리고 흔들린 뒤에는]은 성공했다. 비록 쇼케이스라는 형식의 특성상 무언가 이미지만 던져주고 떠난 흐릿함이 아쉽다. 구성원들의 생각이 보다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맥락에 대한 접근이 그리 친절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작은 그것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아주 두껍고 난해한 책의 서문을 다양하게 경험한 기분이다.
Written by 펠릭스 언더우드